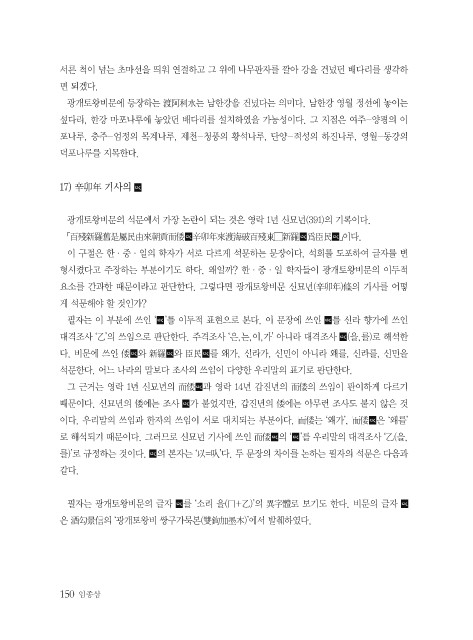Page 152 - 오산문화총서 8집
P. 152
서른 척이 넘는 초마선을 띄워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판자를 깔아 강을 건넜던 배다리를 생각하
면 되겠다.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渡阿利水는 남한강을 건넜다는 의미다. 남한강 영월 정선에 놓이는
섶다리, 한강 마포나루에 놓았던 배다리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이다. 그 지점은 여주-양평의 이
포나루, 충주-엄정의 목계나루, 제천-청풍의 황석나루, 단양-적성의 하진나루, 영월-동강의
덕포나루를 지목한다.
17) 辛卯年 기사의
광개토왕비문의 석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락 1년 신묘년(391)의 기록이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 辛卯年來渡海破百殘東新羅 爲臣民 」이다.
이 구절은 한·중·일의 학자가 서로 다르게 석문하는 문장이다. 석회를 도포하여 글자를 변
형시켰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일까? 한·중·일 학자들이 광개토왕비문의 이두적
요소를 간과한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비문 신묘년(辛卯年)條의 기사를 어떻
게 석문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 부분에 쓰인 ‘ ’를 이두적 표현으로 본다. 이 문장에 쓰인 를 신라 향가에 쓰인
대격조사 ‘乙’의 쓰임으로 판단한다. 주격조사 ‘은,는,이,가’ 아니라 대격조사 (을,를)로 해석한
다. 비문에 쓰인 倭 와 新羅 와 臣民 를 왜가, 신라가, 신민이 아니라 왜를, 신라를, 신민을
석문한다. 어느 나라의 말보다 조사의 쓰임이 다양한 우리말의 표기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영락 1년 신묘년의 而倭 과 영락 14년 갑진년의 而倭의 쓰임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신묘년의 倭에는 조사 가 붙었지만, 갑진년의 倭에는 아무런 조사도 붙지 않은 것
이다. 우리말의 쓰임과 한자의 쓰임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而倭는 ‘왜가’, 而倭 은 ‘왜를’
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묘년 기사에 쓰인 而倭 의 ‘ ’를 우리말의 대격조사 ‘乙(을,
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의 본자는 ‘以=㕥’다. 두 문장의 차이를 논하는 필자의 석문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광개토왕비문의 글자 를 ‘소리 을(口+乙)’의 異字體로 보기도 한다. 비문의 글자
은 酒勾景信의 ‘광개토왕비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에서 발췌하였다.
150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