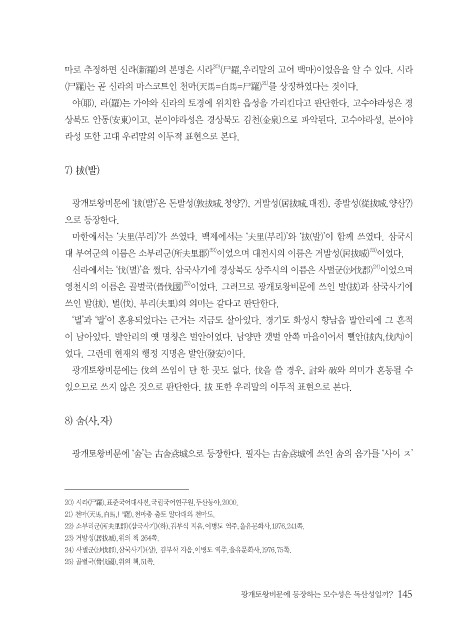Page 147 - 오산문화총서 8집
P. 147
20)
마로 추정하면 신라(新羅)의 본명은 시라 (尸羅,우리말의 고어 백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라
21)
(尸羅)는 곧 신라의 마스코트인 천마(天馬=白馬=尸羅) 를 상징하였다는 것이다.
야(耶), 라(羅)는 가야와 신라의 토경에 위치한 읍성을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고수야라성은 경
상북도 안동(安東)이고, 분이야라성은 경상북도 김천(金泉)으로 파악된다. 고수야라성, 분이야
라성 또한 고대 우리말의 이두적 표현으로 본다.
7) 拔(발)
광개토왕비문에 ‘拔(발)’은 돈발성(敦拔城,청양?), 거발성(居拔城,대전), 종발성(從拔城,양산?)
으로 등장한다.
마한에서는 ‘夫里(부리)’가 쓰였다. 백제에서는 ‘夫里(부리)’와 ‘拔(발)’이 함께 쓰였다. 삼국시
23)
22)
대 부여군의 이름은 소부리군(所夫里郡) 이었으며 대전시의 이름은 거발성(居拔城) 이었다.
24)
신라에서는 ‘伐(벌)’을 썼다. 삼국사기에 경상북도 상주시의 이름은 사벌군(沙伐郡) 이었으며
25)
영천시의 이름은 골벌국(骨伐國) 이었다. 그러므로 광개토왕비문에 쓰인 발(拔)과 삼국사기에
쓰인 발(拔), 벌(伐), 부리(夫里)의 의미는 같다고 판단한다.
‘벌’과 ‘발’이 혼용되었다는 근거는 지금도 살아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그 흔적
이 남아있다. 발안리의 옛 명칭은 벌안이었다. 남양만 갯벌 안쪽 마을이어서 뻘안(拔內,伐內)이
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 지명은 발안(發安)이다.
광개토왕비문에는 伐의 쓰임이 단 한 곳도 없다. 伐을 쓸 경우, 討와 破와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拔 또한 우리말의 이두적 표현으로 본다.
8) 舍(사,자)
광개토왕비문에 ‘舍’는 古舍鳶城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古舍鳶城에 쓰인 舍의 음가를 ‘사이 ㅈ’
20) 시라(尸羅),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두산동아,2000.
21) 천마(天馬,白馬,尸羅),천마총 출토 말다래의 천마도.
22) 소부리군(所夫里郡)《삼국사기》(하),김부식 지음,이병도 역주,을유문화사,1976,241쪽.
23) 거발성(居拔城),위의 책 264쪽.
24) 사벌군(沙伐郡),삼국사기》(상), 김부식 지음,이병도 역주,을유문화사,1976,75쪽.
25) 골벌국(骨伐國),위의 책,51쪽.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모수성은 독산성일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