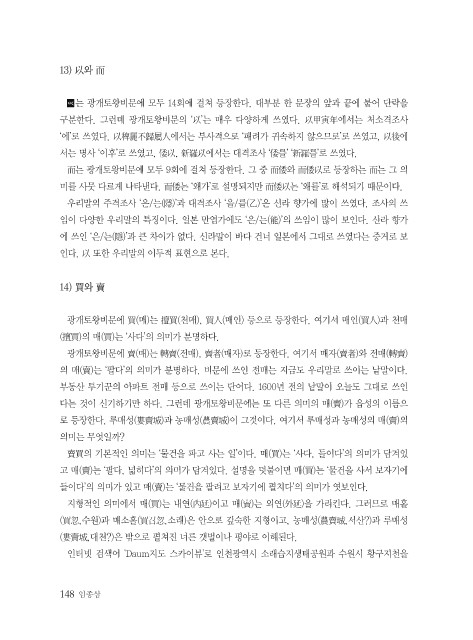Page 150 - 오산문화총서 8집
P. 150
13) 以와 而
는 광개토왕비문에 모두 14회에 걸쳐 등장한다. 대부분 한 문장의 앞과 끝에 붙어 단락을
구분한다. 그런데 광개토왕비문의 ‘以’는 매우 다양하게 쓰였다. 以甲寅年에서는 처소격조사
‘에’로 쓰였다. 以稗麗不歸屬人에서는 부사격으로 ‘패려가 귀속하지 않으므로’로 쓰였고, 以後에
서는 명사 ‘이후’로 쓰였고, 倭以, 新羅以에서는 대격조사 ‘倭를’ ‘新羅를’로 쓰였다.
而는 광개토왕비문에 모두 9회에 걸쳐 등장한다. 그 중 而倭와 而倭以로 등장하는 而는 그 의
미를 사뭇 다르게 나타낸다. 而倭는 ‘왜가’로 설명되지만 而倭以는 ‘왜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주격조사 ‘은/는(隱)’과 대격조사 ‘을/를(乙)’은 신라 향가에 많이 쓰였다. 조사의 쓰
임이 다양한 우리말의 특징이다. 일본 만엽가에도 ‘은/는(能)’의 쓰임이 많이 보인다. 신라 향가
에 쓰인 ‘은/는(隱)’과 큰 차이가 없다. 신라말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그대로 쓰였다는 증거로 보
인다. 以 또한 우리말의 이두적 표현으로 본다.
14) 買와 賣
광개토왕비문에 買(매)는 擅買(천매), 買人(매인) 등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매인(買人)과 천매
(擅買)의 매(買)는 ‘사다’의 의미가 분명하다.
광개토왕비문에 賣(매)는 轉賣(전매), 賣者(매자)로 등장한다. 여기서 매자(賣者)와 전매(轉賣)
의 매(賣)는 ‘팔다’의 의미가 분명하다. 비문에 쓰인 전매는 지금도 우리말로 쓰이는 낱말이다.
부동산 투기꾼의 아파트 전매 등으로 쓰이는 단어다. 1600년 전의 낱말이 오늘도 그대로 쓰인
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광개토왕비문에는 또 다른 의미의 매(賣)가 읍성의 이름으
로 등장한다. 루매성(婁賣城)과 농매성(農賣城)이 그것이다. 여기서 루매성과 농매성의 매(賣)의
의미는 무엇일까?
賣買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건을 파고 사는 일’이다. 매(買)는 ‘사다, 들이다’의 의미가 담겨있
고 매(賣)는 ‘팔다, 넓히다’의 의미가 담겨있다. 설명을 덧붙이면 매(買)는 ‘물건을 사서 보자기에
들이다’의 의미가 있고 매(賣)는 ‘물건을 팔려고 보자기에 펼치다’의 의미가 엿보인다.
지형적인 의미에서 매(買)는 내연(內延)이고 매(賣)는 외연(外延)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매홀
(買忽,수원)과 매소홀(買召忽,소래)은 안으로 깊숙한 지형이고, 농매성(農賣城,서산?)과 루매성
(婁賣城,대천?)은 밖으로 펼쳐진 너른 갯벌이나 평야로 이해된다.
인터넷 검색어 'Daum지도 스카이뷰'로 인천광역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수원시 황구지천을
148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