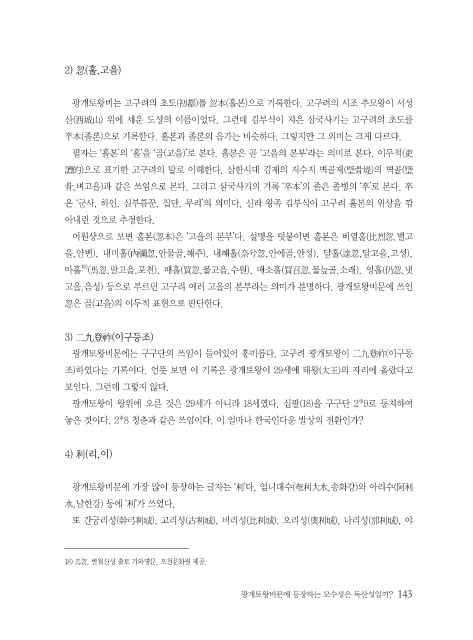Page 145 - 오산문화총서 8집
P. 145
2) 忽(홀,고을)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의 초도(初都)를 忽本(홀본)으로 기록한다.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이 서성
산(西城山) 위에 세운 도성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초도를
卒本(졸본)으로 기록한다. 홀본과 졸본의 음가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필자는 ‘홀본’의 ‘홀’을 ‘골(고을)’로 본다. 홀본은 곧 ‘고을의 본부’라는 의미로 본다. 이두적(吏
讀的)으로 표기한 고구려의 말로 이해한다. 삼한시대 김제의 저수지 벽골제(璧骨堤)의 벽골(璧
骨,벼고을)과 같은 쓰임으로 본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 ‘卒本’의 졸은 졸병의 ‘卒’로 본다. 卒
은 ‘군사, 하인, 심부름꾼, 집단, 무리’의 의미다. 신라 왕족 김부식이 고구려 홀본의 위상을 깎
아내린 것으로 추정한다.
어원상으로 보면 홀본(忽本)은 ‘고을의 본부’다. 설명을 덧붙이면 홀본은 비열홀(比烈忽,별고
을,안변), 내미홀(內彌忽,안물골,해주), 내혜홀(奈兮忽,안에골,안성), 달홀(達忽,달고을,고성),
18)
마홀 (馬忽,말고을,포천), 매홀(買忽,물고을,수원), 매소홀(買召忽,물늪골,소래), 잉홀(仍忽,냇
고을,음성) 등으로 부르던 고구려 여러 고을의 본부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광개토왕비문에 쓰인
忽은 골(고을)의 이두적 표현으로 판단한다.
3) 二九登祚(이구등조)
광개토왕비문에는 구구단의 쓰임이 들어있어 흥미롭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二九登祚(이구등
조)하였다는 기록이다. 언뜻 보면 이 기록은 광개토왕이 29세에 태왕(太王)의 자리에 올랐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광개토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29세가 아니라 18세였다. 십팔(18)을 구구단 2*9로 등치하여
놓은 것이다. 2*8 청춘과 같은 쓰임이다. 이 얼마나 한국인다운 발상의 전환인가?
4) 利(리,이)
광개토왕비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는 ‘利’다. 엄니대수(奄利大水,송화강)와 아리수(阿利
水,남한강) 등에 ‘利’가 쓰였다.
또 간궁리성(幹弓利城), 고리성(古利城), 비리성(比利城), 오리성(奧利城), 나리성(那利城), 야
18) 馬忽, 반월산성 출토 기와명문, 포천문화원 제공.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모수성은 독산성일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