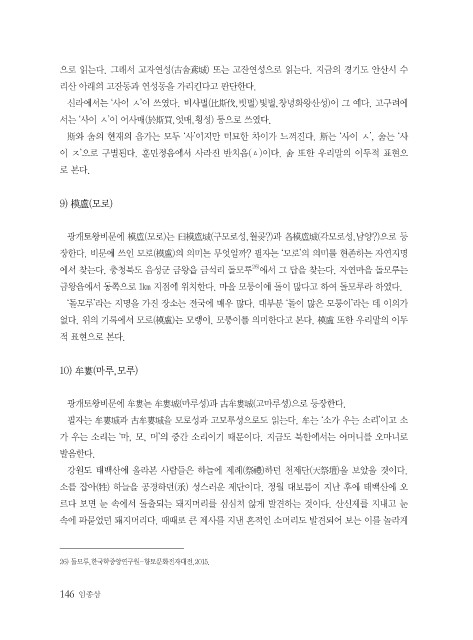Page 148 - 오산문화총서 8집
P. 148
으로 읽는다. 그래서 고자연성(古舍鳶城) 또는 고잔연성으로 읽는다.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수
리산 아래의 고잔동과 연성동을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신라에서는 ‘사이 ㅅ’이 쓰였다. 비사벌(比斯伐,빗벌>빛벌,창녕화왕산성)이 그 예다. 고구려에
서는 ‘사이 ㅅ’이 어사매(於斯買,엇매,횡성) 등으로 쓰였다.
斯와 舍의 현재의 음가는 모두 ‘사’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斯는 ‘사이 ㅅ’, 舍는 ‘사
이 ㅈ’으로 구별된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반치음(ㅿ)이다. 舍 또한 우리말의 이두적 표현으
로 본다.
9) 模盧(모로)
광개토왕비문에 模盧(모로)는 臼模盧城(구모로성,월곶?)과 各模盧城(각모로성,남양?)으로 등
장한다. 비문에 쓰인 모로(模盧)의 의미는 무엇일까? 필자는 ‘모로’의 의미를 현존하는 자연지명
26)
에서 찾는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돌모루 에서 그 답을 찾는다. 자연마을 돌모루는
금왕읍에서 동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다. 마을 모퉁이에 돌이 많다고 하여 돌모루라 하였다.
‘돌모루’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는 전국에 매우 많다. 대부분 ‘돌이 많은 모퉁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위의 기록에서 모로(模盧)는 모랭이, 모퉁이를 의미한다고 본다. 模盧 또한 우리말의 이두
적 표현으로 본다.
10) 牟婁(마루,모루)
광개토왕비문에 牟婁는 牟婁城(마루성)과 古牟婁城(고마루성)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牟婁城과 古牟婁城을 모로성과 고모루성으로도 읽는다. 牟는 ‘소가 우는 소리’이고 소
가 우는 소리는 ‘마, 모, 머’의 중간 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어머니를 오마니로
발음한다.
강원도 태백산에 올라본 사람들은 하늘에 제례(祭禮)하던 천제단(天祭壇)을 보았을 것이다.
소를 잡아(牲) 하늘을 공경하던(氶) 성스러운 제단이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 후에 태백산에 오
르다 보면 눈 속에서 돌출되는 돼지머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고 눈
속에 파묻었던 돼지머리다. 때때로 큰 제사를 지낸 흔적인 소머리도 발견되어 보는 이를 놀라게
26) 돌모루,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2015.
146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