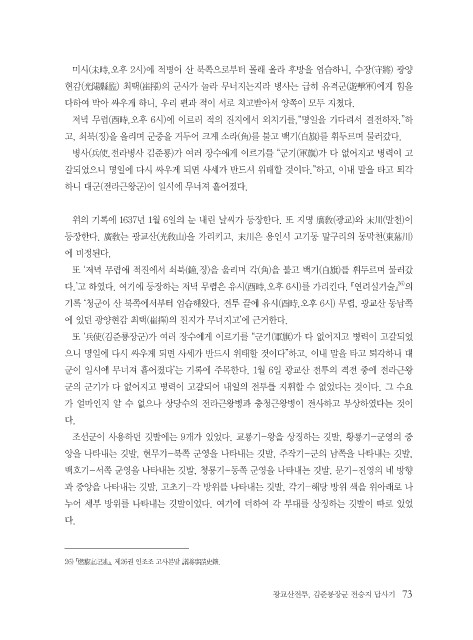Page 75 - 오산문화총서 7집
P. 75
미시(未時,오후 2시)에 적병이 산 북쪽으로부터 몰래 올라 후방을 엄습하니, 수장(守將) 광양
현감(光陽縣監) 최택(崔擇)의 군사가 놀라 무너지는지라 병사는 급히 유격군(遊擊軍)에게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게 하니, 우리 편과 적이 서로 치고받아서 양쪽이 모두 지쳤다.
저녁 무렵(酉時,오후 6시)에 이르러 적의 진지에서 외치기를,“명일을 기다려서 결전하자.”하
고, 쇠북(징)을 울리며 군중을 거두어 크게 소라(角)를 불고 백기(白旗)를 휘두르며 물러갔다.
병사(兵使,전라병사 김준룡)가 여러 장수에게 이르기를 “군기(軍旗)가 다 없어지고 병력이 고
갈되었으니 명일에 다시 싸우게 되면 사세가 반드시 위태할 것이다.”하고, 이내 말을 타고 퇴각
하니 대군(전라근왕군)이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다.
위의 기록에 1637년 1월 6일의 눈 내린 날씨가 등장한다. 또 지명 廣敎(광교)와 末川(말천)이
등장한다. 廣敎는 광교산(光敎山)을 가리키고, 末川은 용인시 고기동 말구리의 동막천(東幕川)
에 비정된다.
또 ‘저녁 무렵에 적진에서 쇠북(鐘,징)을 울리며 각(角)을 불고 백기(白旗)를 휘두르며 물러갔
26)
다.’고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저녁 무렵은 유시(酉時,오후 6시)를 가리킨다. 『연려실기술』 의
기록 ‘청군이 산 북쪽에서부터 엄습해왔다. 전투 끝에 유시(酉時,오후 6시) 무렵, 광교산 동남쪽
에 있던 광양현감 최택(崔擇)의 진지가 무너지고’에 근거한다.
또 ‘兵使(김준룡장군)가 여러 장수에게 이르기를 “군기(軍旗)가 다 없어지고 병력이 고갈되었
으니 명일에 다시 싸우게 되면 사세가 반드시 위태할 것이다”하고, 이내 말을 타고 퇴각하니 대
군이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다’는 기록에 주목한다. 1월 6일 광교산 전투의 격전 중에 전라근왕
군의 군기가 다 없어지고 병력이 고갈되어 내일의 전투를 지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수요
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전라근왕병과 충청근왕병이 전사하고 부상하였다는 것이
다.
조선군이 사용하던 깃발에는 9개가 있었다. 교룡기-왕을 상징하는 깃발, 황룡기-군영의 중
앙을 나타내는 깃발, 현무기-북쪽 군영을 나타내는 깃발, 주작기-군의 남쪽을 나타내는 깃발,
백호기-서쪽 군영을 나타내는 깃발, 청룡기-동쪽 군영을 나타내는 깃발, 문기-진영의 네 방향
과 중앙을 나타내는 깃발, 고초기-각 방위를 나타내는 깃발, 각기-해당 방위 색을 위아래로 나
누어 세부 방위를 나타내는 깃발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각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따로 있었
다.
26) 『燃藜室記述』, 제26권 인조조 고사본말 諸將事蹟史籍.
광교산전투, 김준룡장군 전승지 답사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