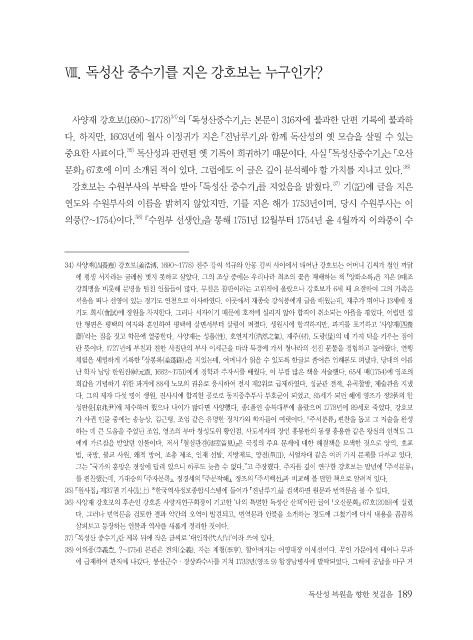Page 191 - 오산문화총서 7집
P. 191
Ⅷ. 독성산 중수기를 지은 강호보는 누구인가?
34)
사양재 강호보(1690~1778) 의 「독성산중수기」는 본문이 316자에 불과한 단편 기록에 불과하
다. 하지만, 1603년에 월사 이정귀가 지은 「진남루기」와 함께 독산성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35)
중요한 사료이다. 독산성과 관련된 옛 기록이 희귀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성산중수기」는 『오산
문화』 67호에 이미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은 깊이 분석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36)
37)
강호보는 수원부사의 부탁을 받아 「독성산 중수기」를 지었음을 밝혔다. 기(記)에 글을 지은
연도와 수원부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를 지은 해가 1753년이며, 당시 수원부사는 이
38)
의풍(?~1754)이다. 『수원부 선생안』을 통해 1751년 12월부터 1754년 윤 4월까지 이의풍이 수
34) 사양재(四養齋) 강호보(姜浩溥, 1690~1778) 진주 강씨 석규와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강호보는 어머니 김씨가 첩인 까닭
에 평생 서자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살았다. 그의 조상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꽃을 재배하는 책 『양화소록』을 지은 9대조
강희맹을 비롯해 문명을 떨친 인물들이 많다. 부친은 참판이라는 고위직에 올랐으나 강호보가 6세 때 요절하여 그의 가족은
서울을 떠나 선영이 있는 경기도 연천으로 이사하였다. 이곳에서 재종숙 강석붕에게 글을 배웠는데, 재주가 뛰어나 13세에 경
기도 회시(會試)에 장원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자이기 때문에 호적에 실리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어렵던 집
안 형편은 평택의 여자와 혼인하여 평택에 살면서부터 살림이 펴졌다. 생원시에 합격하지만, 과거를 포기하고 ‘사양재(四養
齋)’라는 집을 짓고 학문에 열중한다. 사양재는 성품(性), 호연지기(浩然之氣), 재주(材), 도량(量)의 네 가지 덕을 키우는 집이
란 뜻이다. 1727년에 부친과 친한 사절단의 부사 이세근을 따라 북경에 가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연행
체험을 세밀하게 기록한 『상봉록(桑蓬錄)』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도 펴냈다. 당대의 이름
난 학자 남당 한원진(韓元震, 1682~1751)에게 경학과 주자서를 배웠다. 이 무렵 많은 책을 저술했다. 65세 때(1754)에 영조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과거에 88세 노모의 권유로 응시하여 전시 제2위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 유곡찰방, 제술관을 지냈
다. 그의 제자 다섯 명이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공로로 동지중추부사 부호군이 되었고, 85세가 되던 해에 영조가 정2품의 한
성판윤[京兆尹]에 제수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면 사양했다. 종1품인 숭록대부에 올랐으며 1778년에 89세로 죽었다. 강호보
가 사귄 인물 중에는 송능상, 김근행, 조엄 같은 유명한 정치가와 학자들이 여럿이다. 『주서분류』 편찬을 돕고 그 저술을 완성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조엄, 영조의 부마 창성도위 황인점,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한의 동생 홍용한 같은 왕실의 인척도 그
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이다. 저서 『칠실관견(漆室管見)』은 국정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양역, 호포
법, 국방, 불교 사원, 왜적 방어, 조총 제조, 인재 선발, 지방제도, 양전(量田), 서얼차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국가의 흥망은 경장에 달려 있으니 하루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자를 깊이 연구한 강호보는 말년에 『주서분류』
를 편찬했는데, 기대승의 『주자문록』, 정경세의 『주문작해』, 정조의 『주서백선』과 비교해 볼 만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35) 『월사집』 제37권 기사(記上)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에 들어가 「진남루기」를 검색하면 원문과 번역문을 볼 수 있다.
36) 사양재 강호보의 후손인 강호흔 사양재연구회장이 기고한 ‘나의 특별한 독성산 산책’이란 글이 『오산문화』 67호(2019)에 실렸
다. 그러나 번역문을 검토한 결과 약간의 오역이 발견되고, 번역문과 인물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기에 다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장하는 인물과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37) 「독성산 중수기」란 제목 뒤에 작은 글씨로 ‘대인작(代人作)’이라 쓰여 있다.
38) 이의풍(李義豊, ?~1754)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계형(季亨). 할아버지는 어영대장 이세선이다. 무인 가문에서 태어나 무과
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봉산군수·경상좌수사를 거쳐 1733년(영조 9) 함경남병사에 발탁되었다. 그해에 공납을 마구 거
독산성 복원을 향한 첫걸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