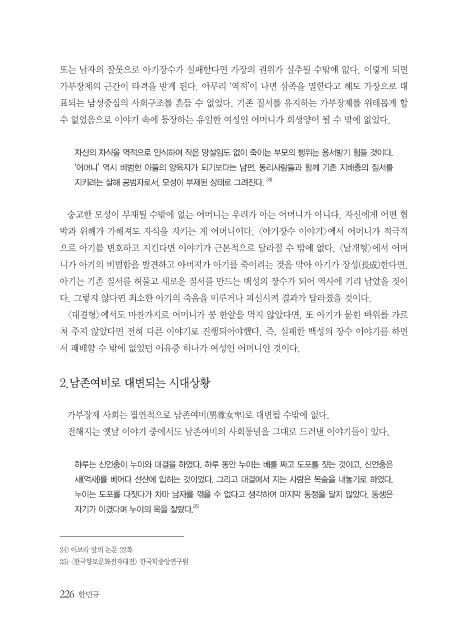Page 228 - 오산학 연구 4집
P. 228
또는 남자의 잘못으로 아기장수가 실패한다면 가장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가부장제의 근간이 타격을 받게 된다. 아무리 ‘역적’이 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해도 가장으로 대
표되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흔들 수 없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가부장제를 위태롭게 할
수 없었음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인 어머니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의 자식을 역적으로 인식하여 작은 망설임도 없이 죽이는 부모의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 것이다.
‘어머니’ 역시 비범한 아들의 양육자가 되기보다는 남편, 동리사람들과 함께 기존 지배층의 질서를
지키려는 살해 공범자로서, 모성이 부재된 상태로 그려진다. 24)
숭고한 모성이 부재될 수밖에 없는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협
박과 위해가 가해져도 자식을 지키는 게 어머니이다. <아기장수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적극적
으로 아기를 변호하고 지킨다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날개형>에서 어머
니가 아기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아기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 아기가 장성(長成)한다면,
아기는 기존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백성의 장수가 되어 역사에 기리 남았을 것이
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아기의 죽음을 미루거나 피신시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대결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콩 한알을 먹지 않았다면, 또 아기가 묻힌 바위를 가르
쳐 주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어야했다. 즉, 실패한 백성의 장수 이야기를 하면
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여성인 어머니인 것이다.
2.남존여비로 대변되는 시대상황
가부장제 사회는 필연적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로 대변될 수밖에 없다.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남존여비의 사회통념을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들이 있다.
하루는 신언충이 누이와 대결을 하였다. 하루 동안 누이는 베를 짜고 도포를 짓는 것이고, 신언충은
새(억새)를 베어다 선산에 입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결에서 지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기로 하였다.
누이는 도포를 다짓다가 차마 남자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동정을 달지 않았다. 동생은
자기가 이겼다며 누이의 목을 잘랐다. 25)
24) 이보라 앞의 논문 22쪽
2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26 한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