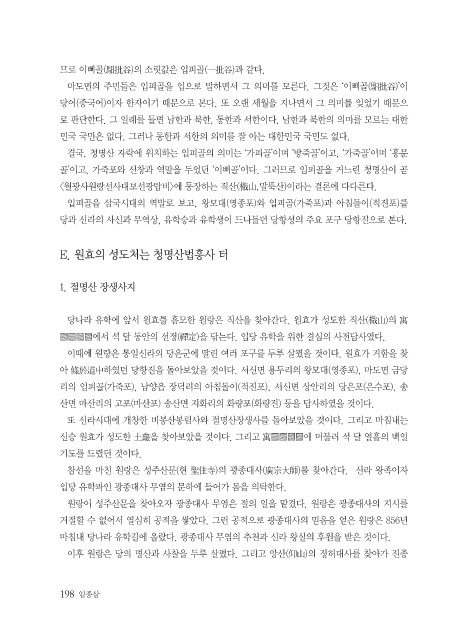Page 200 - 오산학 연구 4집
P. 200
므로 이삐골(馹批谷)의 소릿값은 입피골(一批谷)과 같다.
마도면의 주민들은 입피골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 의미를 모른다. 그것은 ‘이삐골(馹批谷)’이
당어(중국어)이자 한자이기 때문으로 본다.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잊었기 때문으
로 판단한다. 그 일례를 들면 남한과 북한, 동한과 서한이다. 남한과 북한의 의미를 모르는 대한
민국 국민은 없다. 그러나 동한과 서한의 의미를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도 없다.
결국, 청명산 자락에 위치하는 입피골의 의미는 ‘가피골’이며 ‘방죽골’이고, ‘가죽골’이며 ‘홍문
골’이고, 가죽포와 신창과 역말을 두었던 ‘이삐골’이다. 그러므로 입피골을 거느린 청명산이 곧
〈월광사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에 등장하는 직산(樴山,말뚝산)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입피골을 삼국시대의 역말로 보고, 왕모대(영종포)와 입피골(가죽포)과 아침돌이(적진포)를
당과 신라의 사신과 무역상, 유학승과 유학생이 드나들던 당항성의 주요 포구 당항진으로 본다.
E. 원효의 성도처는 청명산법흥사 터
1. 절명산 장생사지
당나라 유학에 앞서 원효를 흠모한 원랑은 직산을 찾아간다. 원효가 성도한 직산(樴山)의 寓
▧▧▧▧에서 석 달 동안의 선정(禪定)을 닦는다. 입당 유학을 위한 결심의 사전답사였다.
이때에 원랑은 통일신라의 당은군에 딸린 여러 포구를 두루 살폈을 것이다. 원효가 거함을 찾
아 條於道中하였던 당항진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서신면 용두리의 왕모대(영종포), 마도면 금당
리의 입피골(가죽포), 남양읍 장덕리의 아침돌이(적진포), 서신면 상안리의 당은포(은수포), 송
산면 마산리의 고포(마산포) 송산면 지화리의 화량포(화량진) 등을 답사하였을 것이다.
또 신라시대에 개창한 비봉산봉림사와 절명산장생사를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승 원효가 성도한 土龕을 찾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寓▨▨▨▨에 머물러 석 달 열흘의 백일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참선을 마친 원랑은 성주산문(현 聖住寺)의 광종대사(廣宗大師)를 찾아간다. 신라 왕족이자
입당 유학파인 광종대사 무염의 문하에 들어가 몸을 의탁한다.
원랑이 성주산문을 찾아오자 광종대사 무염은 절의 일을 맡겼다. 원랑은 광종대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서 열심히 공적을 쌓았다. 그런 공적으로 광종대사의 믿음을 얻은 원랑은 856년
마침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광종대사 무염의 추천과 신라 왕실의 후원을 받은 것이다.
이후 원랑은 당의 명산과 사찰을 두루 살폈다. 그리고 앙산(仰山)의 징허대사를 찾아가 진종
198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