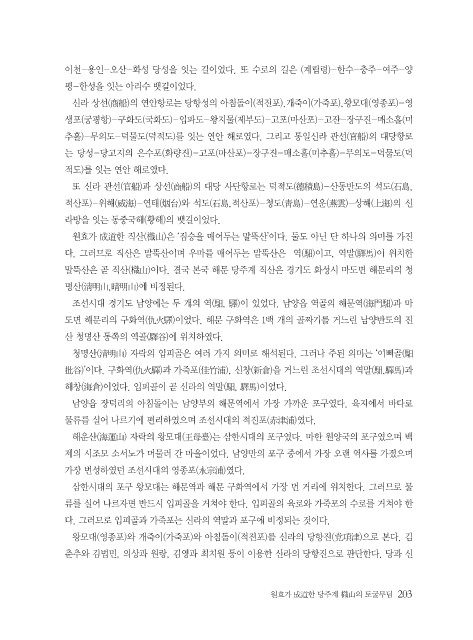Page 205 - 오산학 연구 4집
P. 205
이천-용인-오산-화성 당성을 잇는 길이었다. 또 수로의 길은 (계립령)-한수-충주-여주-양
평-한성을 잇는 아리수 뱃길이었다.
신라 상선(商船)의 연안항로는 당항성의 아침돌이(적진포),개죽이(가죽포),왕모대(영종포)-영
생포(궁평항)-구화도(국화도)-입파도-왕지물(제부도)-고포(마산포)-고잔-장구진-매소홀(미
추홀)-무의도-덕물도(덕적도)를 잇는 연안 해로였다. 그리고 통일신라 관선(官船)의 대당항로
는 당성-당고지의 은수포(화량진)-고포(마산포)-장구진-매소홀(미추홀)-무의도-덕물도(덕
적도)를 잇는 연안 해로였다.
또 신라 관선(官船)과 상선(商船)의 대당 사단항로는 덕적도(德積島)-산동반도의 석도(石島,
적산포)-위해(威海)-연태(烟台)와 석도(石島,적산포)-청도(靑島)-연운(燕雲)-상해(上海)의 신
라방을 잇는 동중국해(황해)의 뱃길이었다.
원효가 成道한 직산(樴山)은 ‘짐승을 매어두는 말뚝산’이다.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러므로 직산은 말뚝산이며 우마를 매어두는 말뚝산은 역(馹)이고, 역말(驛馬)이 위치한
말뚝산은 곧 직산(樴山)이다. 결국 본국 해문 당주계 직산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의 청
명산(淸明山,晴明山)에 비정된다.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에는 두 개의 역(馹, 驛)이 있었다. 남양읍 역골의 해문역(海門馹)과 마
도면 해문리의 구화역(仇火驛)이었다. 해문 구화역은 1백 개의 골짜기를 거느린 남양반도의 진
산 청명산 동쪽의 역골(驛谷)에 위치하였다.
청명산(淸明山) 자락의 입피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된 의미는 ‘이삐골(馹
批谷)’이다. 구화역(仇火驛)과 가죽포(佳竹浦), 신창(新倉)을 거느린 조선시대의 역말(馹,驛馬)과
해창(海倉)이었다. 입피골이 곧 신라의 역말(馹, 驛馬)이었다.
남양읍 장덕리의 아침돌이는 남양부의 해문역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였다. 육지에서 바다로
물류를 실어 나르기에 편리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적진포(赤津浦)였다.
해운산(海運山) 자락의 왕모대(王母臺)는 삼한시대의 포구였다. 마한 원양국의 포구였으며 백
제의 시조모 소서노가 머물러 간 마을이었다. 남양만의 포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가장 번성하였던 조선시대의 영종포(永宗浦)였다.
삼한시대의 포구 왕모대는 해문역과 해문 구화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물
류를 실어 나르자면 반드시 입피골을 거쳐야 한다. 입피골의 육로와 가죽포의 수로를 거쳐야 한
다. 그러므로 입피골과 가죽포는 신라의 역말과 포구에 비정되는 것이다.
왕모대(영종포)와 개죽이(가죽포)와 아침돌이(적진포)를 신라의 당항진(党項津)으로 본다. 김
춘추와 김법민, 의상과 원랑, 김영과 최치원 등이 이용한 신라의 당항진으로 판단한다. 당과 신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