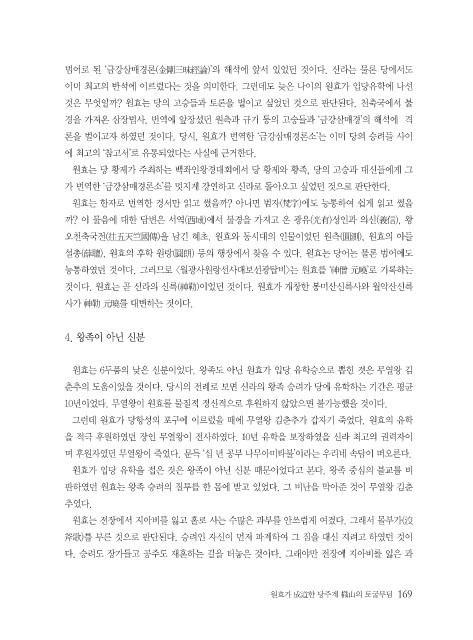Page 171 - 오산학 연구 4집
P. 171
범어로 된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의 해석에 앞서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물론 당에서도
이미 최고의 반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늦은 나이의 원효가 입당유학에 나선
것은 무엇일까? 원효는 당의 고승들과 토론을 벌이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축국에서 불
경을 가져온 삼장법사, 번역에 앞장섰던 원측과 규기 등의 고승들과 ‘금강삼매경’의 해석에 격
론을 벌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원효가 번역한 ‘금강삼매경론소’는 이미 당의 승려들 사이
에 최고의 ‘참고서’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원효는 당 황제가 주최하는 백좌인왕경대회에서 당 황제와 황족, 당의 고승과 대신들에게 그
가 번역한 ‘금강삼매경론소’를 멋지게 강연하고 신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원효는 한자로 번역한 경서만 읽고 썼을까? 아니면 범자(梵字)에도 능통하여 쉽게 읽고 썼을
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서역(西域)에서 불경을 가지고 온 광유(光有)성인과 의신(義信), 왕
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긴 혜초, 원효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원측(圓測), 원효의 아들
설총(薛聰), 원효의 후학 원랑(圓朗) 등의 행장에서 찾을 수 있다. 원효는 당어는 물론 범어에도
능통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월광사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는 원효를 ‘神僧 元曉’로 기록하는
것이다. 원효는 곧 신라의 신륵(神勒)이었던 것이다. 원효가 개창한 봉미산신륵사와 월악산신륵
사가 神勒 元曉를 대변하는 것이다.
4. 왕족이 아닌 신분
원효는 6두품의 낮은 신분이었다. 왕족도 아닌 원효가 입당 유학승으로 뽑힌 것은 무열왕 김
춘추의 도움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전례로 보면 신라의 왕족 승려가 당에 유학하는 기간은 평균
10년이었다. 무열왕이 원효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효가 당항성의 포구에 이르렀을 때에 무열왕 김춘추가 갑자기 죽었다. 원효의 유학
을 적극 후원하였던 장인 무열왕이 전사하였다. 10년 유학을 보장하였을 신라 최고의 권력자이
며 후원자였던 무열왕이 죽었다. 문득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른다.
원효가 입당 유학을 접은 것은 왕족이 아닌 신분 때문이었다고 본다. 왕족 중심의 불교를 비
판하였던 원효는 왕족 승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 비난을 막아준 것이 무열왕 김춘
추였다.
원효는 전장에서 지아비를 잃고 홀로 사는 수많은 과부를 안쓰럽게 여겼다. 그래서 몰부가(沒
斧歌)를 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승려인 자신이 먼저 파계하여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였던 것이
다. 승려도 장가들고 공주도 재혼하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래야만 전장에 지아비를 잃은 과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