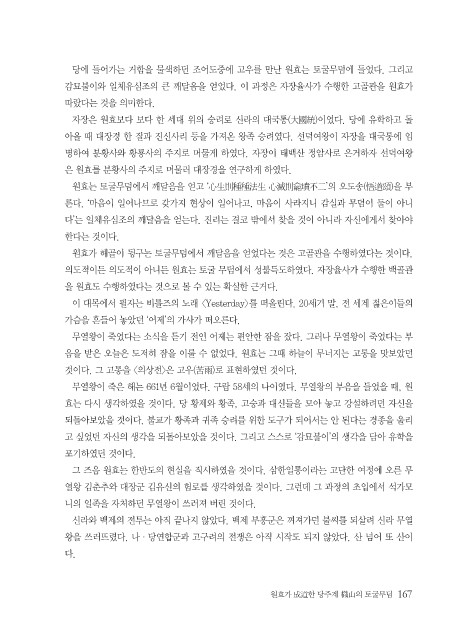Page 169 - 오산학 연구 4집
P. 169
당에 들어가는 거함을 물색하던 조어도중에 고우를 만난 원효는 토굴무덤에 들었다. 그리고
감묘불이와 일체유심조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 과정은 자장율사가 수행한 고골관을 원효가
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장은 원효보다 보다 한 세대 위의 승려로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었다. 당에 유학하고 돌
아올 때 대장경 한 질과 진신사리 등을 가져온 왕족 승려였다. 선덕여왕이 자장을 대국통에 임
명하여 분황사와 황룡사의 주지로 머물게 하였다. 자장이 태백산 정암사로 은거하자 선덕여왕
은 원효를 분황사의 주지로 머물러 대장경을 연구하게 하였다.
원효는 토굴무덤에서 깨달음을 얻고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龕墳不二’의 오도송(悟道頌)을 부
른다.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
다’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는다.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효가 해골이 뒹구는 토굴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고골관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원효는 토굴 무덤에서 성불득도하였다. 자장율사가 수행한 백골관
을 원효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비틀즈의 노래 <Yesterday>를 떠올린다. 20세기 말,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어제’의 가사가 떠오른다.
무열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인 어제는 편안한 잠을 잤다. 그러나 무열왕이 죽었다는 부
음을 받은 오늘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원효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 고통을 〈의상전〉은 고우(苦雨)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무열왕이 죽은 해는 661년 6월이었다. 구랍 58세의 나이였다. 무열왕의 부음을 들었을 때, 원
효는 다시 생각하였을 것이다. 당 황제와 황족, 고승과 대신들을 모아 놓고 강설하려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불교가 황족과 귀족 승려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
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감묘불이’의 생각을 담아 유학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 즈음 원효는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였을 것이다. 삼한일통이라는 고단한 여정에 오른 무
열왕 김춘추와 대장군 김유신의 험로를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의 초입에서 석가모
니의 일족을 자처하던 무열왕이 쓰러져 버린 것이다.
신라와 백제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제 부흥군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려 신라 무열
왕을 쓰러뜨렸다. 나·당연합군과 고구려의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산 넘어 또 산이
다.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