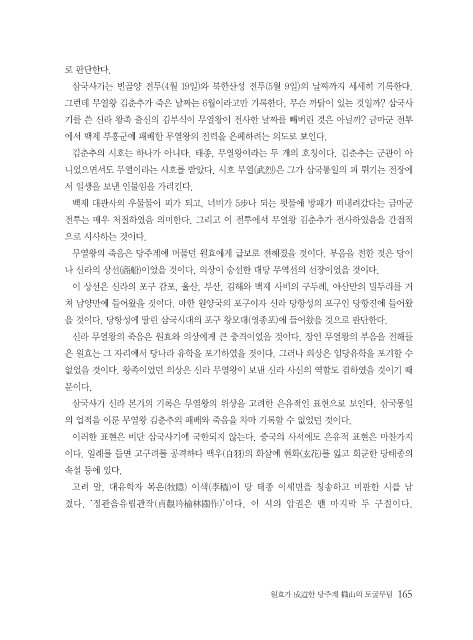Page 167 - 오산학 연구 4집
P. 167
로 판단한다.
삼국사기는 빈골양 전투(4월 19일)와 북한산성 전투(5월 9일)의 날짜까지 세세히 기록한다.
그런데 무열왕 김춘추가 죽은 날짜는 6월이라고만 기록한다.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삼국사
기를 쓴 신라 왕족 출신의 김부식이 무열왕이 전사한 날짜를 빼버린 것은 아닐까? 금마군 전투
에서 백제 부흥군에 패배한 무열왕의 전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춘추의 시호는 하나가 아니다. 태종, 무열왕이라는 두 개의 호칭이다. 김춘추는 군관이 아
니었으면서도 무열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시호 무열(武烈)은 그가 삼국통일의 피 튀기는 전장에
서 일생을 보낸 인물임을 가리킨다.
백제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가 되고, 너비가 5步나 되는 핏물에 방패가 떠내려갔다는 금마군
전투는 매우 처절하였음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무열왕 김춘추가 전사하였음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무열왕의 죽음은 당주계에 머물던 원효에게 급보로 전해졌을 것이다. 부음을 전한 것은 당이
나 신라의 상선(商船)이었을 것이다. 의상이 승선한 대당 무역선의 선장이었을 것이다.
이 상선은 신라의 포구 감포, 울산, 부산, 김해와 백제 사비의 구두레, 아산만의 밀두리를 거
쳐 남양만에 들어왔을 것이다. 마한 원양국의 포구이자 신라 당항성의 포구인 당항진에 들어왔
을 것이다. 당항성에 딸린 삼국시대의 포구 왕모대(영종포)에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한다.
신라 무열왕의 죽음은 원효와 의상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장인 무열왕의 부음을 전해들
은 원효는 그 자리에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의상은 입당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왕족이었던 의상은 신라 무열왕이 보낸 신라 사신의 역할도 겸하였을 것이기 때
문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기록은 무열왕의 위상을 고려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의 업적을 이룬 무열왕 김춘추의 패배와 죽음을 차마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비단 삼국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사서에도 은유적 표현은 마찬가지
이다. 일례를 들면 고구려를 공격하다 백우(白羽)의 화살에 현화(玄花)를 잃고 회군한 당태종의
속설 등에 있다.
고려 말, 대유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당 태종 이세민을 칭송하고 비판한 시를 남
겼다. ‘정관음유림관작(貞觀吟楡林關作)’이다. 이 시의 압권은 맨 마지막 두 구절이다.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