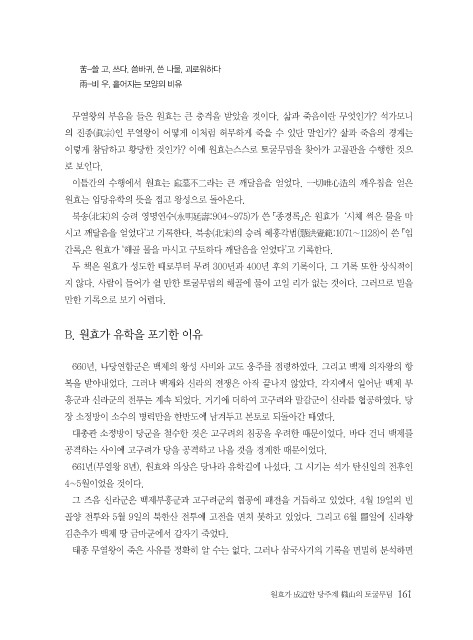Page 163 - 오산학 연구 4집
P. 163
苦-쓸 고, 쓰다, 씀바귀, 쓴 나물, 괴로워하다
雨-비 우, 흩어지는 모양의 비유
무열왕의 부음을 들은 원효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석가모니
의 진종(眞宗)인 무열왕이 어떻게 이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렇게 참담하고 황당한 것인가? 이에 원효는스스로 토굴무덤을 찾아가 고골관을 수행한 것으
로 보인다.
이틀간의 수행에서 원효는 龕墓不二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一切唯心造의 깨우침을 얻은
원효는 입당유학의 뜻을 접고 왕성으로 돌아온다.
북송(北宋)의 승려 영명연수(永明延壽:904~975)가 쓴 「종경록」은 원효가 ‘시체 썩은 물을 마
시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한다. 북송(北宋)의 승려 혜홍각범(慧洪覺範:1071∼1128)이 쓴 「임
간록」은 원효가 ‘해골 물을 마시고 구토하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한다.
두 책은 원효가 성도한 때로부터 무려 300년과 400년 후의 기록이다. 그 기록 또한 상식적이
지 않다. 사람이 들어가 쉴 만한 토굴무덤의 해골에 물이 고일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B. 원효가 유학을 포기한 이유
660년,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왕성 사비와 고도 웅주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백제 의자왕의 항
복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지에서 일어난 백제 부
흥군과 신라군의 전투는 계속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고구려와 말갈군이 신라를 협공하였다. 당
장 소정방이 소수의 병력만을 한반도에 남겨두고 본토로 되돌아간 때였다.
대총관 소정방이 당군을 철수한 것은 고구려의 침공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바다 건너 백제를
공격하는 사이에 고구려가 당을 공격하고 나올 것을 경계한 때문이었다.
661년(무열왕 8년),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다. 그 시기는 석가 탄신일의 전후인
4~5월이었을 것이다.
그 즈음 신라군은 백제부흥군과 고구려군의 협공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4월 19일의 빈
골양 전투와 5월 9일의 북한산 전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6월 ▨일에 신라왕
김춘추가 백제 땅 금마군에서 갑자기 죽었다.
태종 무열왕이 죽은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