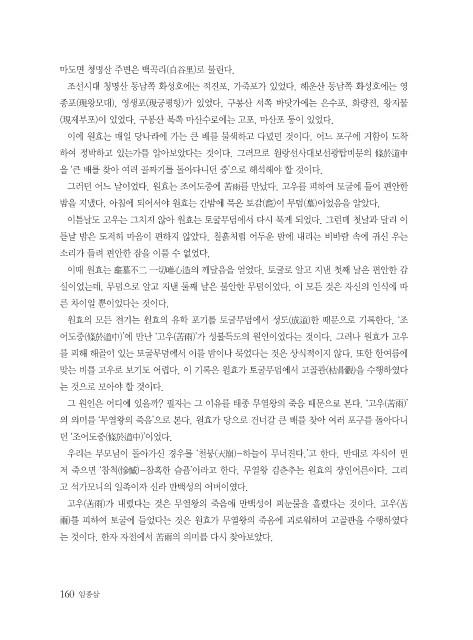Page 162 - 오산학 연구 4집
P. 162
마도면 청명산 주변은 백곡리(白谷里)로 불린다.
조선시대 청명산 동남쪽 화성호에는 적진포, 가죽포가 있었다. 해운산 동남쪽 화성호에는 영
종포(現왕모대), 영생포(現궁평항)가 있었다. 구봉산 서쪽 바닷가에는 은수포, 화량진, 왕지물
(現제부포)이 있었다. 구봉산 북쪽 마산수로에는 고포, 마산포 등이 있었다.
이에 원효는 매일 당나라에 가는 큰 배를 물색하고 다녔던 것이다. 어느 포구에 거함이 도착
하여 정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문의 條於道中
을 ‘큰 배를 찾아 여러 골짜기를 돌아다니던 중’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원효는 조어도중에 苦雨를 만났다. 고우를 피하여 토굴에 들어 편안한
밤을 지냈다. 아침에 되어서야 원효는 간밤에 묵은 토감(龕)이 무덤(墓)이었음을 알았다.
이튿날도 고우는 그치지 않아 원효는 토굴무덤에서 다시 묵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과 달리 이
튿날 밤은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칠흙처럼 어두운 밤에 내리는 비바람 속에 귀신 우는
소리가 들려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때 원효는 龕墓不二 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었다. 토굴로 알고 지낸 첫째 날은 편안한 감
실이었는데, 무덤으로 알고 지낸 둘째 날은 불안한 무덤이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인식에 따
른 차이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원효의 모든 전기는 원효의 유학 포기를 토굴무덤에서 성도(成道)한 때문으로 기록한다. ‘조
어도중(條於道中)’에 만난 ‘고우(苦雨)’가 성불득도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효가 고우
를 피해 해골이 있는 토굴무덤에서 이틀 밤이나 묵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한여름에
맞는 비를 고우로 보기도 어렵다. 이 기록은 원효가 토굴무덤에서 고골관(枯骨觀)을 수행하였다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그 이유를 태종 무열왕의 죽음 때문으로 본다. ‘고우(苦雨)’
의 의미를 ‘무열왕의 죽음’으로 본다. 원효가 당으로 건너갈 큰 배를 찾아 여러 포구를 돌아다니
던 ‘조어도중(條於道中)’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를 ‘천붕(天崩)-하늘이 무너진다.’고 한다. 반대로 자식이 먼
저 죽으면 ‘참척(慘慽)-참혹한 슬픔’이라고 한다. 무열왕 김춘추는 원효의 장인어른이다. 그리
고 석가모니의 일족이자 신라 만백성의 어버이였다.
고우(苦雨)가 내렸다는 것은 무열왕의 죽음에 만백성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고우(苦
雨)를 피하여 토굴에 들었다는 것은 원효가 무열왕의 죽음에 괴로워하며 고골관을 수행하였다
는 것이다. 한자 자전에서 苦雨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았다.
160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