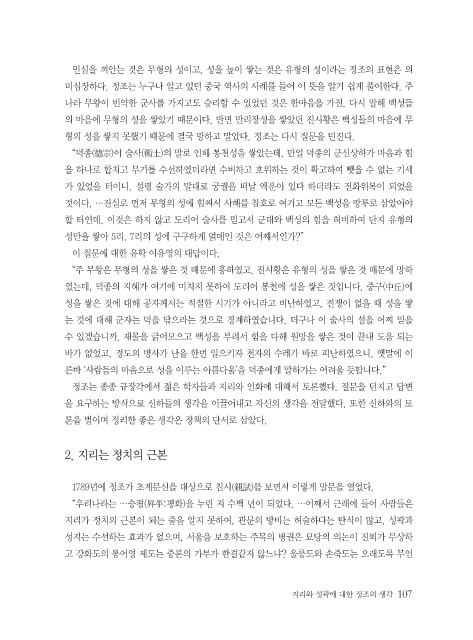Page 109 - 오산학 연구 4집
P. 109
민심을 껴안는 것은 무형의 성이고, 성을 높이 쌓는 것은 유형의 성이라는 정조의 표현은 의
미심장하다. 정조는 누구나 알고 있던 중국 역사의 사례를 들어 이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주
나라 무왕이 빈약한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을 가진, 다시 말해 백성들
의 마음에 무형의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반면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은 백성들의 마음에 무
형의 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 정조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덕종(德宗)이 술사(術士)의 말로 인해 봉천성을 쌓았는데, 만일 덕종의 군신상하가 마음과 힘
을 하나로 합치고 무기를 수선하였더라면 수비하고 호위하는 것이 확고하여 뺏을 수 없는 기세
가 있었을 터이니, 설령 술가의 말대로 궁궐을 떠날 액운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이 되었을
것이다. …진실로 먼저 무형의 성에 힘써서 사해를 참호로 여기고 모든 백성을 망루로 삼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술사를 믿고서 군대와 백성의 힘을 허비하여 단지 유형의
성만을 쌓아 5리, 7리의 성에 구구하게 얽매인 것은 어째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유학 이유영의 대답이다.
“주 무왕은 무형의 성을 쌓은 것 때문에 흥하였고, 진시황은 유형의 성을 쌓은 것 때문에 망하
였는데, 덕종의 지혜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도리어 봉천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중구(中丘)에
성을 쌓은 것에 대해 공자께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비난하였고, 전쟁이 없을 때 성을 쌓
는 것에 대해 군자는 덕을 닦으라는 것으로 경계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술사의 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긁어모으고 백성을 부려서 힘을 다해 원망을 쌓은 것이 끝내 도움 되는
바가 없었고, 경도의 병사가 난을 한번 일으키자 천자의 수레가 바로 피난하였으니, 옛말에 이
른바 ‘사람들의 마음으로 성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덕종에게 말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정조는 종종 규장각에서 젊은 학자들과 지리와 인화에 대해서 토론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
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하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또한 신하와의 토
론을 벌이며 정리한 좋은 생각은 정책의 단서로 삼았다.
2. 지리는 정치의 근본
1789년에 정조가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친시(親試)를 보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승평(昇平:평화)을 누린 지 수백 년이 되었다. …어째서 근래에 들어 사람들은
지리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여, 관문의 방비는 허술하다는 탄식이 많고, 성곽과
성지는 수선하는 효과가 없으며, 서울을 보호하는 주목의 병권은 묘당의 의논이 진퇴가 무상하
고 강화도의 통어영 제도는 중론의 가부가 한결같지 않느냐? 울릉도와 손죽도는 오래도록 무인
지리와 성곽에 대한 정조의 생각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