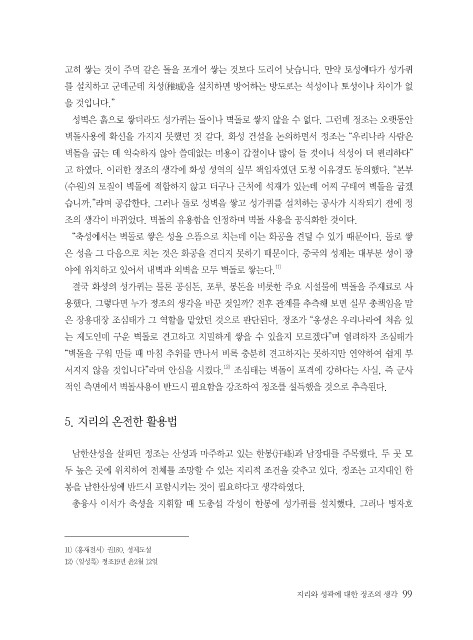Page 101 - 오산학 연구 4집
P. 101
고히 쌓는 것이 주먹 같은 돌을 포개어 쌓는 것보다 도리어 낫습니다. 만약 토성에다가 성가퀴
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치성(稚城)을 설치하면 방어하는 방도로는 석성이나 토성이나 차이가 없
을 것입니다.”
성벽은 흙으로 쌓더라도 성가퀴는 돌이나 벽돌로 쌓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조는 오랫동안
벽돌사용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화성 건설을 논의하면서 정조는 “우리나라 사람은
벽돌을 굽는 데 익숙하지 않아 쓸데없는 비용이 갑절이나 많이 들 것이니 석성이 더 편리하다”
고 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생각에 화성 성역의 실무 책임자였던 도청 이유경도 동의했다. “본부
(수원)의 토질이 벽돌에 적합하지 않고 더구나 근처에 석재가 있는데 어찌 구태여 벽돌을 굽겠
습니까.”라며 공감한다. 그러나 돌로 성벽을 쌓고 성가퀴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
조의 생각이 바뀌었다. 벽돌의 유용함을 인정하며 벽돌 사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축성에서는 벽돌로 쌓은 성을 으뜸으로 치는데 이는 화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돌로 쌓
은 성을 그 다음으로 치는 것은 화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제는 대부분 성이 광
야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벽과 외벽을 모두 벽돌로 쌓는다. 11)
결국 화성의 성가퀴는 물론 공심돈, 포루, 봉돈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 벽돌을 주재료로 사
용했다. 그렇다면 누가 정조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전후 관계를 추측해 보면 실무 총책임을 맡
은 장용대장 조심태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가 “옹성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
는 제도인데 구운 벽돌로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염려하자 조심태가
“벽돌을 구워 만들 때 마침 추위를 만나서 비록 충분히 견고하지는 못하지만 연약하여 쉽게 부
12)
서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안심을 시켰다. 조심태는 벽돌이 포격에 강하다는 사실, 즉 군사
적인 측면에서 벽돌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여 정조를 설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지리의 온전한 활용법
남한산성을 살피던 정조는 산성과 마주하고 있는 한봉(汗峰)과 남장대를 주목했다. 두 곳 모
두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조는 고지대인 한
봉을 남한산성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총융사 이서가 축성을 지휘할 때 도총섭 각성이 한봉에 성가퀴를 설치했다. 그러나 병자호
11) <홍재전서> 권180, 성제도설
12) <일성록> 정조19년 윤2월 12일
지리와 성곽에 대한 정조의 생각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