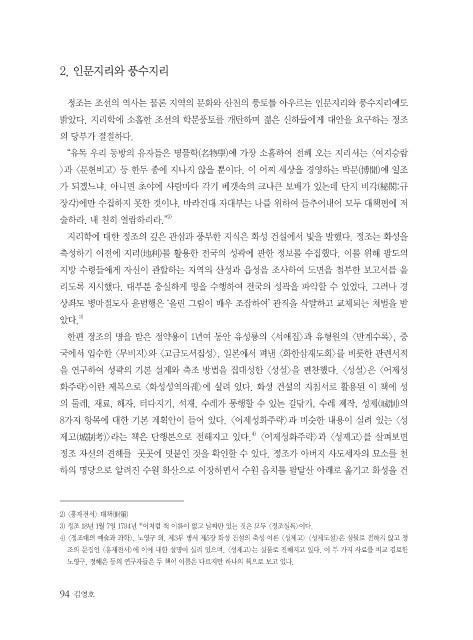Page 96 - 오산학 연구 4집
P. 96
2. 인문지리와 풍수지리
정조는 조선의 역사는 물론 지역의 문화와 산천의 풍토를 아우르는 인문지리와 풍수지리에도
밝았다. 지리학에 소홀한 조선의 학문풍토를 개탄하며 젊은 신하들에게 대안을 요구하는 정조
의 당부가 절절하다.
“유독 우리 동방의 유자들은 명물학(名物學)에 가장 소홀하여 전해 오는 지리서는 <여지승람
>과 <문헌비고> 등 한두 종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 어찌 세상을 경영하는 박문(博聞)에 일조
가 되겠느냐. 아니면 초야에 사람마다 각기 베갯속의 크나큰 보배가 있는데 단지 비각(秘閣:규
장각)에만 수집하지 못한 것이냐. 바라건대 자대부는 나를 위하여 들추어내어 모두 대책편에 저
2)
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지리학에 대한 정조의 깊은 관심과 풍부한 지식은 화성 건설에서 빛을 발했다. 정조는 화성을
축성하기 이전에 지리(地利)를 활용한 전국의 성곽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팔도의
지방 수령들에게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산성과 읍성을 조사하여 도면을 첨부한 보고서를 올
리도록 지시했다. 대부분 충실하게 명을 수행하여 전국의 성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
상좌도 병마절도사 윤범행은 ‘올린 그림이 매우 조잡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교체되는 처벌을 받
3)
았다.
한편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1년여 동안 유성룡의 <서애집>과 유형원의 <반계수록>, 중
국에서 입수한 <무비지>와 <고금도서집성>, 일본에서 펴낸 <화한삼재도회>를 비롯한 관련서적
을 연구하여 성곽의 기본 설계와 축조 방법을 집대성한 <성설>을 편찬했다. <성설>은 <어제성
화주략>이란 제목으로 <화성성역의궤>에 실려 있다. 화성 건설의 지침서로 활용된 이 책에 성
의 둘레, 재료, 해자, 터다지기, 석재, 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길닦기, 수레 제작, 성제(城制)의
8가지 항목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들어 있다. <어제성화주략>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는 <성
4)
제고(城制考)>라는 책은 단행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제성화주략>과 <성제고>를 살펴보면
정조 자신의 견해를 곳곳에 덧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
하의 명당으로 알려진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화성을 건
2) <홍재전서> 대책(對策)
3) 정조 18년 1월 7일 1794년 *이처럼 책 이름이 없고 날짜만 있는 것은 모두 <정조실록>이다.
4)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노영구 외, 제3부 병서 제5장 화성 건설의 축성 이론 <성제고> <성제도설>은 실물로 전하지 않고 정
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이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으며, <성제고>는 실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료를 비교 검토한
노영구, 정해은 등의 연구자들은 두 책이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의 책으로 보고 있다.
94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