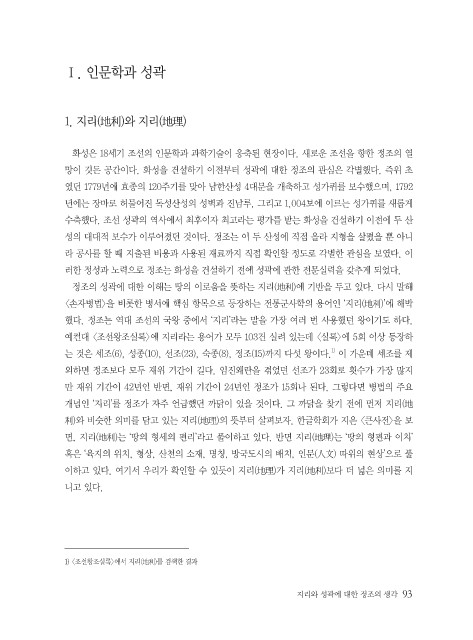Page 95 - 오산학 연구 4집
P. 95
Ⅰ. 인문학과 성곽
1. 지리(地利)와 지리(地理)
화성은 18세기 조선의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응축된 현장이다. 새로운 조선을 향한 정조의 열
망이 깃든 공간이다. 화성을 건설하기 이전부터 성곽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각별했다. 즉위 초
였던 1779년에 효종의 120주기를 맞아 남한산성 4대문을 개축하고 성가퀴를 보수했으며, 1792
년에는 장마로 허물어진 독성산성의 성벽과 진남루, 그리고 1,004보에 이르는 성가퀴를 새롭게
수축했다. 조선 성곽의 역사에서 최후이자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화성을 건설하기 이전에 두 산
성의 대대적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조는 이 두 산성에 직접 올라 지형을 살폈을 뿐 아니
라 공사를 할 때 지출된 비용과 사용된 재료까지 직접 확인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러한 정성과 노력으로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기 전에 성곽에 관한 전문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정조의 성곽에 대한 이해는 땅의 이로움을 뜻하는 지리(地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손자병법>을 비롯한 병서에 핵심 항목으로 등장하는 전통군사학의 용어인 ‘지리(地利)’에 해박
했다. 정조는 역대 조선의 국왕 중에서 ‘지리’라는 말을 가장 여러 번 사용했던 왕이기도 하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에 지리라는 용어가 모두 103건 실려 있는데 <실록>에 5회 이상 등장하
1)
는 것은 세조(6), 성종(10), 선조(23), 숙종(8), 정조(15)까지 다섯 왕이다. 이 가운데 세조를 제
외하면 정조보다 모두 재위 기간이 길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가 23회로 횟수가 가장 많지
만 재위 기간이 42년인 반면, 재위 기간이 24년인 정조가 15회나 된다. 그렇다면 병법의 주요
개념인 ‘지리’를 정조가 자주 언급했던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을 찾기 전에 먼저 지리(地
利)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리(地理)의 뜻부터 살펴보자. 한글학회가 지은 <큰사전>을 보
면, 지리(地利)는 ‘땅의 형세의 편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면 지리(地理)는 ‘땅의 형편과 이치’
혹은 ‘육지의 위치, 형상, 산천의 소재, 명칭, 방국도시의 배치, 인문(人文) 따위의 현상’으로 풀
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地理)가 지리(地利)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
니고 있다.
1) <조선왕조실록>에서 지리(地利)를 검색한 결과
지리와 성곽에 대한 정조의 생각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