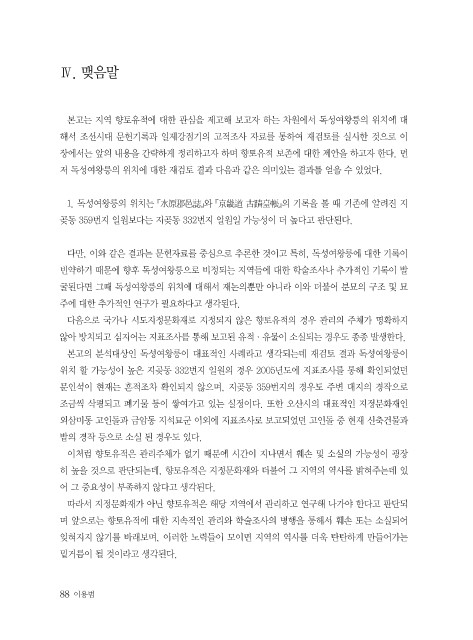Page 90 - 오산학 연구 4집
P. 90
Ⅳ. 맺음말
본고는 지역 향토유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독성여왕릉의 위치에 대
해서 조선시대 문헌기록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자료를 통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이
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하며 향토유적 보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
저 독성여왕릉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독성여왕릉의 위치는 『水原郡邑誌』와 『京畿道 古蹟臺帳』의 기록을 볼 때 기존에 알려진 지
곶동 359번지 일원보다는 지곶동 332번지 일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추론한 것이고 특히, 독성여왕릉에 대한 기록이
빈약하기 때문에 향후 독성여왕릉으로 비정되는 지역들에 대한 학술조사나 추가적인 기록이 발
굴된다면 그때 독성여왕릉의 위치에 대해서 재논의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분묘의 구조 및 묘
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국가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의 경우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고 심지어는 지표조사를 통해 보고된 유적ㆍ유물이 소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독성여왕릉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재검토 결과 독성여왕릉이
위치 할 가능성이 높은 지곶동 332번지 일원의 경우 2005년도에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문인석이 현재는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지곶동 359번지의 경우도 주변 대지의 경작으로
조금씩 삭평되고 폐기물 등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산시의 대표적인 지정문화재인
외삼미동 고인돌과 금암동 지석묘군 이외에 지표조사로 보고되었던 고인돌 중 현재 신축건물과
밭의 경작 등으로 소실 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향토유적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 및 소실의 가능성이 굉장
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토유적은 지정문화재와 더불어 그 지역의 역사를 밝혀주는데 있
어 그 중요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향토유적은 해당 지역에서 관리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
며 앞으로는 향토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학술조사의 병행을 통해서 훼손 또는 소실되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래보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지역의 역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88 이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