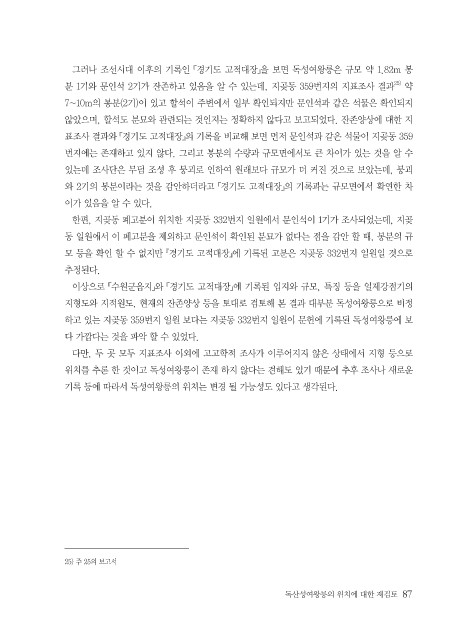Page 89 - 오산학 연구 4집
P. 89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인 『경기도 고적대장』을 보면 독성여왕릉은 규모 약 1.82m 봉
25)
분 1기와 문인석 2기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곶동 359번지의 지표조사 결과 약
7~10m의 봉분(2기)이 있고 할석이 주변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문인석과 같은 석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할석도 분묘와 관련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잔존양상에 대한 지
표조사 결과와 『경기도 고적대장』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먼저 문인석과 같은 석물이 지곶동 359
번지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봉분의 수량과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사단은 무덤 조성 후 붕괴로 인하여 원래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았는데, 붕괴
와 2기의 봉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경기도 고적대장』의 기록과는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곶동 폐고분이 위치한 지곶동 332번지 일원에서 문인석이 1기가 조사되었는데, 지곶
동 일원에서 이 폐고분을 제외하고 문인석이 확인된 분묘가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봉분의 규
모 등을 확인 할 수 없지만 『경기도 고적대장』에 기록된 고분은 지곶동 332번지 일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수원군읍지』와 『경기도 고적대장』에 기록된 입지와 규모, 특징 등을 일제강점기의
지형도와 지적원도, 현재의 잔존양상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독성여왕릉으로 비정
하고 있는 지곶동 359번지 일원 보다는 지곶동 332번지 일원이 문헌에 기록된 독성여왕릉에 보
다 가깝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다만, 두 곳 모두 지표조사 이외에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형 등으로
위치를 추론 한 것이고 독성여왕릉이 존재 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나 새로운
기록 등에 따라서 독성여왕릉의 위치는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25) 주 25의 보고서
독산성여왕릉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