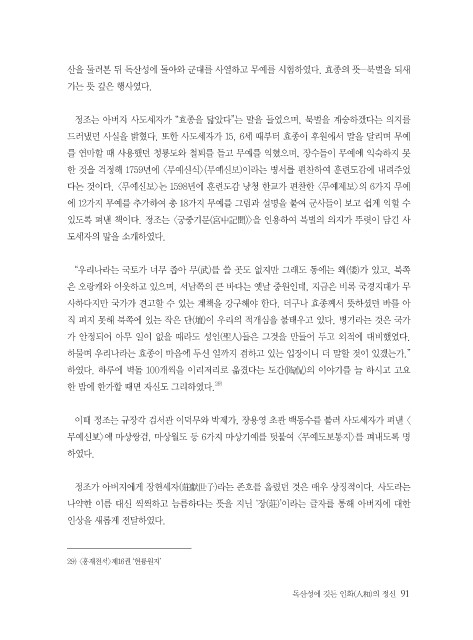Page 93 - 오산학 연구 1집
P. 93
산을 둘러본 뒤 독산성에 돌아와 군대를 사열하고 무예를 시험하였다. 효종의 뜻-북벌을 되새
기는 뜻 깊은 행사였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효종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북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도세자가 15, 6세 때부터 효종이 후원에서 말을 달리며 무예
를 연마할 때 사용했던 청룡도와 철퇴를 들고 무예를 익혔으며, 장수들이 무예에 익숙하지 못
한 것을 걱정해 1759년에 <무예신식>(무예신보)이라는 병서를 편찬하여 훈련도감에 내려주었
다는 것이다. <무예신보>는 1598년에 훈련도감 낭청 한교가 편찬한 <무예제보>의 6가지 무예
에 12가지 무예를 추가하여 총 18가지 무예를 그림과 설명을 붙여 군사들이 보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펴낸 책이다. 정조는 <궁중기문(宮中記聞)>을 인용하여 북벌의 의지가 뚜렷이 담긴 사
도세자의 말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너무 좁아 무(武)를 쓸 곳도 없지만 그래도 동에는 왜(倭)가 있고, 북쪽
은 오랑캐와 이웃하고 있으며, 서남쪽의 큰 바다는 옛날 중원인데, 지금은 비록 국경지대가 무
사하다지만 국가가 견고할 수 있는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구나 효종께서 뜻하셨던 바를 아
직 펴지 못해 북쪽에 있는 작은 단(壇)이 우리의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다. 병기라는 것은 국가
가 안정되어 아무 일이 없을 때라도 성인(聖人)들은 그것을 만들어 두고 외적에 대비했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효종이 마음에 두신 일까지 겸하고 있는 입장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루에 벽돌 100개씩을 이리저리로 옮겼다는 도간(陶侃)의 이야기를 늘 하시고 고요
한 밤에 한가할 때면 자신도 그리하였다. 29)
이때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와 박제가, 장용영 초관 백동수를 불러 사도세자가 펴낸 <
무예신보>에 마상쌍검, 마상월도 등 6가지 마상기예를 덧붙여 <무예도보통지>를 펴내도록 명
하였다.
정조가 아버지에게 장헌세자(莊獻世子)라는 존호를 올렸던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사도라는
나약한 이름 대신 씩씩하고 늠름하다는 뜻을 지닌 ‘장(莊)’이라는 글자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새롭게 전달하였다.
29) <홍재전서>제16권 ‘현륭원지’
독산성에 깃든 인화(人和)의 정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