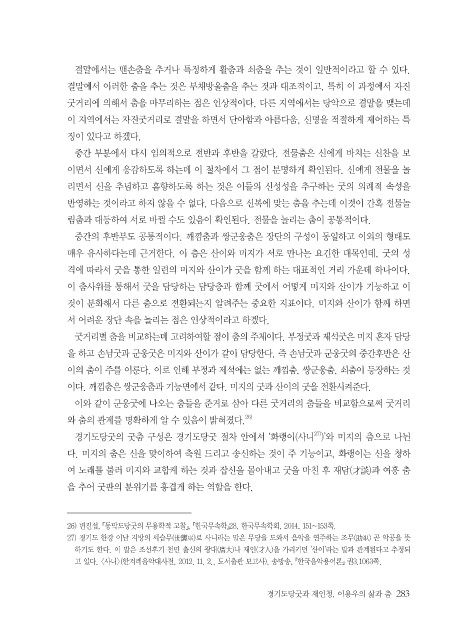Page 285 - 오산학 연구 1집
P. 285
결말에서는 맨손춤을 추거나 특정하게 활춤과 쇠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말에서 이러한 춤을 추는 것은 부채방울춤을 추는 것과 대조적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자진
굿거리에 의해서 춤을 마무리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당악으로 결말을 맺는데
이 지역에서는 자진굿거리로 결말을 하면서 단아함과 아름다움, 신명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특
징이 있다고 하겠다.
중간 부분에서 다시 임의적으로 전반과 후반을 갈랐다. 전물춤은 신에게 바치는 신찬을 보
이면서 신에게 응감하도록 하는데 이 절차에서 그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신에게 전물을 놀
리면서 신을 추념하고 흠향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신성성을 추구하는 굿의 의례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신복에 맞는 춤을 추는데 이것이 간혹 전물놀
림춤과 대등하여 서로 바뀔 수도 있음이 확인된다. 전물을 놀리는 춤이 공통적이다.
중간의 후반부도 공통적이다. 깨낌춤과 쌍군웅춤은 장단의 구성이 동일하고 이외의 형태도
매우 유사하다는데 근거한다. 이 춤은 산이와 미지가 서로 만나는 요긴한 대목인데, 굿의 성
격에 따라서 굿을 통한 일련의 미지와 산이가 굿을 함께 하는 대표적인 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 춤사위를 통해서 굿을 담당하는 담당층과 함께 굿에서 어떻게 미지와 산이가 기능하고 이
것이 분화해서 다른 춤으로 전환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지와 산이가 함께 하면
서 어려운 장단 속을 놀리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하겠다.
굿거리별 춤을 비교하는데 고려하여할 점이 춤의 주체이다. 부정굿과 제석굿은 미지 혼자 담당
을 하고 손님굿과 군웅굿은 미지와 산이가 같이 담당한다. 즉 손님굿과 군웅굿의 중간후반은 산
이의 춤이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부정과 제석에는 없는 깨낌춤, 쌍군웅춤, 쇠춤이 등장하는 것
이다. 깨낌춤은 쌍군웅춤과 기능면에서 같다. 미지의 굿과 산이의 굿을 전환시켜준다.
이와 같이 군웅굿에 나오는 춤들을 준거로 삼아 다른 굿거리의 춤들을 비교함으로써 굿거리
26)
와 춤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이 밝혀졌다.
27)
경기도당굿의 굿춤 구성은 경기도당굿 절차 안에서 ‘화랭이(사니 )’와 미지의 춤으로 나뉜
다. 미지의 춤은 신을 맞이하여 축원 드리고 송신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 화랭이는 신을 청하
여 노래를 불러 미지와 교합케 하는 것과 잡신을 몰아내고 굿을 마친 후 재담(才談)과 여흥 춤
을 추어 굿판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는 역할을 한다.
26) 변진섭, 「동막도당굿의 무용학적 고찰」, 『한국무속학』28, 한국무속학회, 2014, 151~153쪽.
27) 경기도 한강 이남 지방의 세습무(世襲巫)로 사니라는 말은 무당을 도와서 음악을 연주하는 조무(助巫) 곧 악공을 뜻
하기도 한다. 이 말은 조선후기 천민 출신의 광대(廣大)나 재인(才人)을 가리키던 '산이'라는 말과 관계된다고 추정되
고 있다. <사니>(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권3.1063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