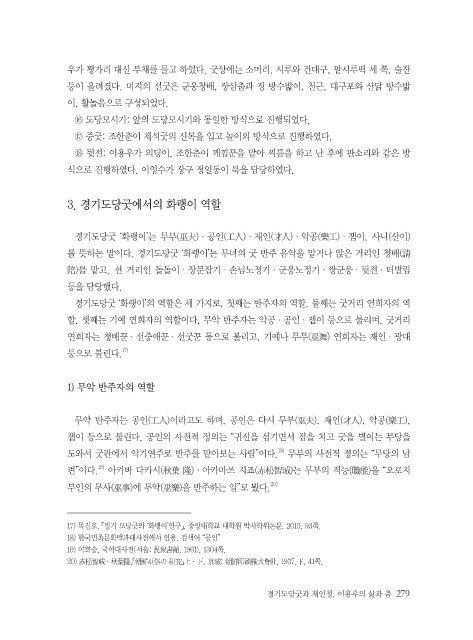Page 281 - 오산학 연구 1집
P. 281
우가 꽹가리 대신 부채를 들고 하였다. 굿상에는 소머리, 시루와 건대구, 팥시루떡 세 쪽, 술잔
등이 올려졌다. 미지의 선굿은 군웅청배, 장삼춤과 징 방수밟이, 천근, 대구포와 산닭 방수밟
이, 활놀음으로 구성되었다.
⑯ 도당모시기: 앞의 도당모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⑰ 중굿: 조한춘이 제석굿의 신복을 입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⑱ 뒷전: 이용우가 의딩이, 조한춘이 깨낌꾼을 맡아 씨름을 하고 난 후에 판소리와 같은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영수가 장구 정일동이 북을 담당하였다.
3. 경기도당굿에서의 화랭이 역할
경기도당굿 ‘화랭이’는 무부(巫夫)ㆍ공인(工人)ㆍ재인(才人)ㆍ악공(樂工)ㆍ잽이, 사니(산이)
를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당굿 ‘화랭이’는 무녀의 굿 반주 음악을 맡거나 앉은 거리인 청배(請
陪)를 맡고, 선 거리인 돌돌이ㆍ장문잡기ㆍ손님노정기ㆍ군웅노정기ㆍ쌍군웅ㆍ뒷전ㆍ터벌림
등을 담당했다.
경기도당굿 ‘화랭이’의 역할은 세 가지로, 첫째는 반주자의 역할, 둘째는 굿거리 연희자의 역
할, 셋째는 기예 연희자의 역할이다. 무악 반주자는 악공ㆍ공인ㆍ잽이 등으로 불리며, 굿거리
연희자는 청배꾼ㆍ선증애꾼ㆍ선굿꾼 등으로 불리고, 기예나 무무(巫舞) 연희자는 재인ㆍ광대
17)
등으로 불린다.
1) 무악 반주자의 역할
무악 반주자는 공인(工人)이라고도 하며, 공인은 다시 무부(巫夫), 재인(才人), 악공(樂工),
잽이 등으로 불린다. 공인의 사전적 정의는 “귀신을 섬기면서 점을 치고 굿을 벌이는 무당을
18)
도와서 굿판에서 악기연주로 반주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무부의 사전적 정의는 “무당의 남
19)
편”이다. 아키바 다카시(秋葉 隆)ㆍ아카마쓰 지죠(赤松智城)는 무부의 직능(職能)을 “오로지
20)
부인의 무사(巫事)에 무악(巫樂)을 반주하는 일”로 봤다.
17)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화랭이’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93쪽.
18)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에서 인용. 검색어 “공인”
19)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民衆書館, 1961), 1304쪽.
20) 赤松智城ㆍ秋葉隆,『朝鮮巫俗の 硏究』上·下,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下, 41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