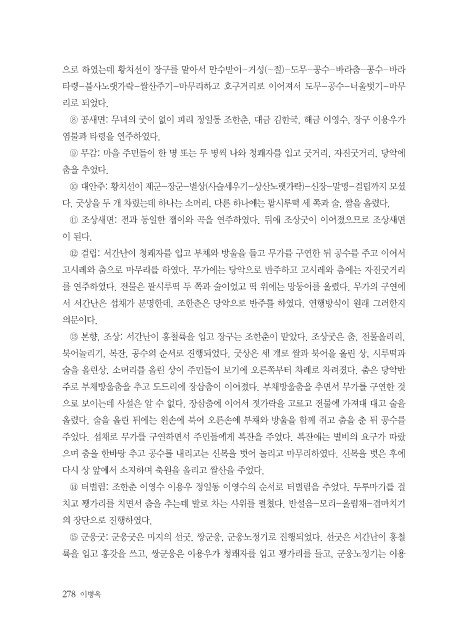Page 280 - 오산학 연구 1집
P. 280
으로 하였는데 황치선이 장구를 맡아서 만수받이-거성(-절)-도무-공수-바라춤-공수-바라
타령-불사노랫가락-쌀산주기-마무리하고 호구거리로 이어져서 도무-공수-너울벗기-마무
리로 되었다.
⑧ 공새면: 무녀의 굿이 없이 피리 정일동 조한춘, 대금 김한국, 해금 이영수, 장구 이용우가
염불과 타령을 연주하였다.
⑨ 무감: 마을 주민들이 한 명 또는 두 명씩 나와 청쾌자를 입고 굿거리, 자진굿거리, 당악에
춤을 추었다.
⑩ 대안주: 황치선이 제군-장군-별상(사슬세우기-상산노랫가락)-신장-말명-걸립까지 모셨
다. 굿상을 두 개 차렸는데 하나는 소머리, 다른 하나에는 팥시루떡 세 쪽과 술, 쌀을 올렸다.
⑪ 조상새면: 전과 동일한 잽이와 곡을 연주하였다. 뒤에 조상굿이 이어졌으므로 조상새면
이 된다.
⑫ 걸립: 서간난이 청쾌자를 입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무가를 구연한 뒤 공수를 주고 이어서
고시레와 춤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무가에는 당악으로 반주하고 고시레와 춤에는 자진굿거리
를 연주하였다. 전물은 팥시루떡 두 쪽과 술이었고 떡 위에는 망둥이를 올렸다. 무가의 구연에
서 서간난은 섭채가 분명한데, 조한춘은 당악으로 반주를 하였다. 연행방식이 원래 그러한지
의문이다.
⑬ 본향, 조상: 서간난이 홍철륙을 입고 장구는 조한춘이 맡았다. 조상굿은 춤, 전물올리리,
북어놀리기, 복잔, 공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굿상은 세 개로 쌀과 북어을 올린 상, 시루떡과
술을 올린상, 소머리를 올린 상이 주민들이 보기에 오른쪽부터 차례로 차려졌다. 춤은 당악반
주로 부채방울춤을 추고 도드리에 장삼춤이 이어졌다. 부채방울춤을 추면서 무가를 구연한 것
으로 보이는데 사설은 알 수 없다. 장삼춤에 이어서 젓가락을 고르고 전물에 가져대 대고 술을
올렸다. 술을 올린 뒤에는 왼손에 북어 오른손에 부채와 방울을 함께 쥐고 춤을 춘 뒤 공수를
주었다. 섭채로 무가를 구연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잔을 주었다. 복잔에는 별비의 요구가 따랐
으며 춤을 한바탕 추고 공수를 내리고는 신복을 벗어 놀리고 마무리하였다. 신복을 벗은 후에
다시 상 앞에서 소지하며 축원을 올리고 쌀산을 주었다.
⑭ 터벌림: 조한춘 이영수 이용우 정일동 이영수의 순서로 터벌림을 추었다. 두루마기를 걸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춤을 추는데 발로 차는 사위를 펼쳤다. 반설음-모리-올림채-겹마치기
의 장단으로 진행하였다.
⑮ 군웅굿: 군웅굿은 미지의 선굿, 쌍군웅, 군웅노정기로 진행되었다. 선굿은 서간난이 홍철
륙을 입고 홍갓을 쓰고, 쌍군웅은 이용우가 청쾌자를 입고 꽹가리를 들고, 군웅노정기는 이용
278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