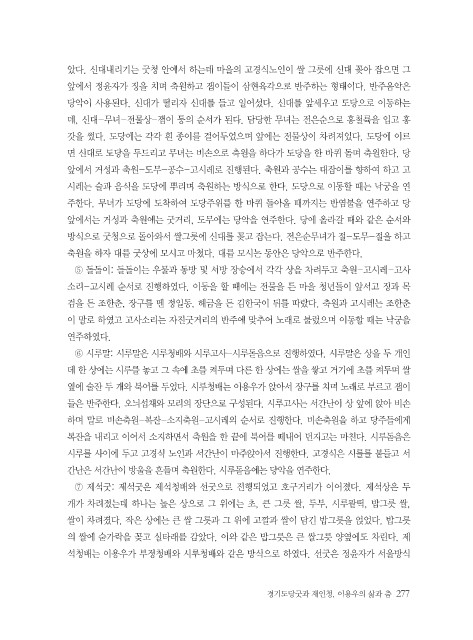Page 279 - 오산학 연구 1집
P. 279
았다. 신대내리기는 굿청 안에서 하는데 마을의 고경식노인이 쌀 그릇에 신대 꽂아 잡으면 그
앞에서 정윤자가 징을 치며 축원하고 잽이들이 삼현육각으로 반주하는 형태이다. 반주음악은
당악이 사용된다. 신대가 떨리자 신대를 들고 일어섰다. 신대를 앞세우고 도당으로 이동하는
데, 신대-무녀-전물상-잽이 등의 순서가 된다. 담당한 무녀는 전은순으로 홍철륙을 입고 홍
갓을 썼다. 도당에는 각각 흰 종이를 걸어두었으며 앞에는 전물상이 차려져있다. 도당에 이르
면 신대로 도당을 두드리고 무녀는 비손으로 축원을 하다가 도당을 한 바퀴 돌며 축원한다. 당
앞에서 거성과 축원-도무-공수-고시레로 진행된다. 축원과 공수는 대잡이를 향하여 하고 고
시레는 술과 음식을 도당에 뿌리며 축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도당으로 이동할 때는 낙궁을 연
주한다. 무녀가 도당에 도착하여 도당주위를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는 반염불을 연주하고 당
앞에서는 거성과 축원에는 굿거리, 도무에는 당악을 연주한다. 당에 올라갈 때와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굿청으로 돌아와서 쌀그릇에 신대를 꽂고 잡는다. 전은순무녀가 절-도무-절을 하고
축원을 하자 대를 굿상에 모시고 마쳤다. 대를 모시는 동안은 당악으로 반주한다.
⑤ 돌돌이: 돌돌이는 우물과 동방 및 서방 장승에서 각각 상을 차려두고 축원-고시레-고사
소리-고시레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동을 할 때에는 전물을 든 마을 청년들이 앞서고 징과 목
검을 든 조한춘, 장구를 멘 정일동, 해금을 든 김한국이 뒤를 따랐다. 축원과 고시레는 조한춘
이 말로 하였고 고사소리는 자진굿거리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으며 이동할 때는 낙궁을
연주하였다.
⑥ 시루말: 시루말은 시루청배와 시루고사-시루돋음으로 진행하였다. 시루말은 상을 두 개인
데 한 상에는 시루를 놓고 그 속에 초를 켜두며 다른 한 상에는 쌀을 쌓고 거기에 초를 켜두며 쌀
옆에 술잔 두 개와 북어를 두었다. 시루청배는 이용우가 앉아서 장구를 치며 노래로 부르고 잽이
들은 반주한다. 오늬섭채와 모리의 장단으로 구성된다. 시루고사는 서간난이 상 앞에 앉아 비손
하며 말로 비손축원-복잔-소지축원-고시레의 순서로 진행한다. 비손축원을 하고 당주들에게
복잔을 내리고 이어서 소지하면서 축원을 한 끝에 북어를 떼내어 던지고는 마친다. 시루돋음은
시루를 사이에 두고 고경식 노인과 서간난이 마주앉아서 진행한다. 고경식은 시를를 붙들고 서
간난은 서간난이 방울을 흔들며 축원한다. 시루돋음에는 당악을 연주한다.
⑦ 제석굿: 제석굿은 제석청배와 선굿으로 진행되었고 호구거리가 이어졌다. 제석상은 두
개가 차려졌는데 하나는 높은 상으로 그 위에는 초, 큰 그릇 쌀, 두부, 시루팥떡, 밥그릇 쌀,
쌀이 차려졌다. 작은 상에는 큰 쌀 그릇과 그 위에 고깔과 쌀이 담긴 밥그릇을 얹었다. 밥그릇
의 쌀에 숟가락을 꽂고 실타래를 감았다. 이와 같은 밥그릇은 큰 쌀그릇 양옆에도 차린다. 제
석청배는 이용우가 부정청배와 시루청배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선굿은 정윤자가 서울방식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