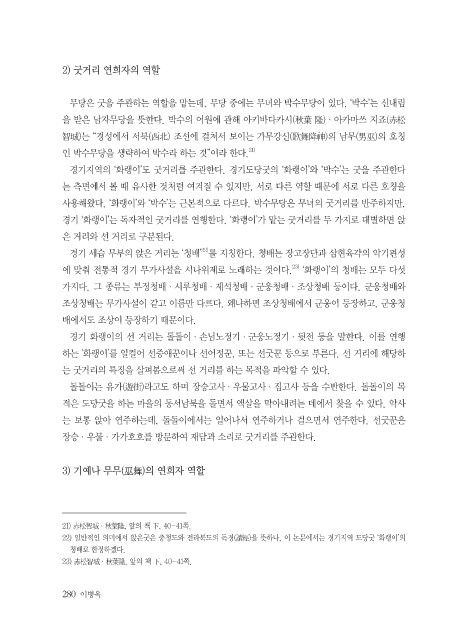Page 282 - 오산학 연구 1집
P. 282
2) 굿거리 연희자의 역할
무당은 굿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는데, 무당 중에는 무녀와 박수무당이 있다. ‘박수’는 신내림
을 받은 남자무당을 뜻한다. 박수의 어원에 관해 아키바다카시(秋葉 隆)ㆍ아카마쓰 지죠(赤松
智城)는 “경성에서 서북(西北) 조선에 걸쳐서 보이는 가무강신(歌舞降神)의 남무(男巫)의 호칭
인 박수무당을 생략하여 박수라 하는 것”이라 한다. 21)
경기지역의 ‘화랭이’도 굿거리를 주관한다. 경기도당굿의 ‘화랭이’와 ‘박수’는 굿을 주관한다
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역할 때문에 서로 다른 호칭을
사용해왔다. ‘화랭이’와 ‘박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박수무당은 무녀의 굿거리를 반주하지만,
경기 ‘화랭이’는 독자적인 굿거리를 연행한다. ‘화랭이’가 맡는 굿거리를 두 가지로 대별하면 앉
은 거리와 선 거리로 구분된다.
22)
경기 세습 무부의 앉은 거리는 ‘청배’ 를 지칭한다. 청배는 장고장단과 삼현육각의 악기편성
23)
에 맞춰 전통적 경기 무가사설을 시나위제로 노래하는 것이다. ‘화랭이’의 청배는 모두 다섯
가지다. 그 종류는 부정청배ㆍ시루청배ㆍ제석청배ㆍ군웅청배ㆍ조상청배 등이다. 군웅청배와
조상청배는 무가사설이 같고 이름만 다르다. 왜냐하면 조상청배에서 군웅이 등장하고, 군웅청
배에서도 조상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경기 화랭이의 선 거리는 돌돌이ㆍ손님노정기ㆍ군웅노정기ㆍ뒷전 등을 말한다. 이를 연행
하는 '화랭이'를 일컬어 선증애꾼이나 선어정꾼, 또는 선굿꾼 등으로 부른다. 선 거리에 해당하
는 굿거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선 거리를 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돌돌이는 유가(遊街)라고도 하며 장승고사ㆍ우물고사ㆍ집고사 등을 수반한다. 돌돌이의 목
적은 도당굿을 하는 마을의 동서남북을 돌면서 액살을 막아내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악사
는 보통 앉아 연주하는데, 돌돌이에서는 일어나서 연주하거나 걸으면서 연주한다. 선굿꾼은
장승ㆍ우물ㆍ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재담과 소리로 굿거리를 주관한다.
3) 기예나 무무(巫舞)의 연희자 역할
21) 赤松智城ㆍ秋葉隆, 앞의 책 下, 40-41쪽.
22) 일반적인 의미에서 앉은굿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독경(讀經)을 뜻하나, 이 논문에서는 경기지역 도당굿 ‘화랭이’의
청배로 한정하겠다.
23) 赤松智城ㆍ秋葉隆, 앞의 책 下, 40-41쪽.
280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