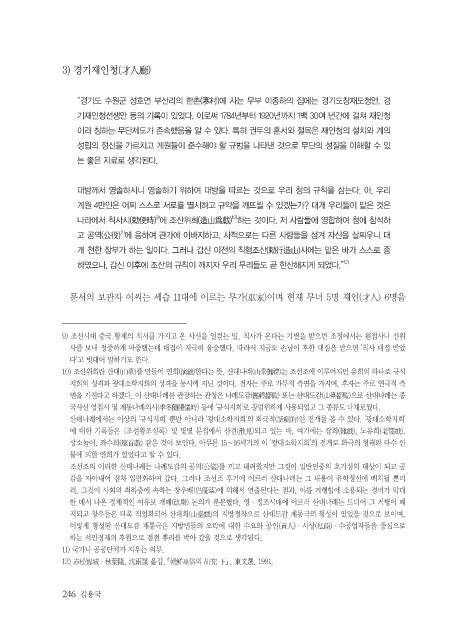Page 248 - 오산학 연구 1집
P. 248
3) 경기재인청(才人廳)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 부산리의 한촌(寒村)에 사는 무부 이종하의 집에는 경기도창재도청안, 경
기재인청선생안 등의 기록이 있었다. 이로써 1784년부터 1920년까지 1백 30여 년간에 걸쳐 재인청
이라 칭하는 무단제도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두의 훈서와 절목은 재인청의 설치와 계의
성립의 정신을 가르치고 계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나타낸 것으로 무단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
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대방께서 영솔하시니 영솔하기 위하여 대방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 청의 규칙을 삼는다. 아, 우리
계원 4만인은 어찌 스스로 서로를 멸시하고 규약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대개 우리들이 맡은 것은
10)
9)
나라에서 칙사시(勅使時) 에 조산위희(造山爲戱) 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에 영합하여 청에 참석하
11)
고 공역(公役) 에 응하여 관가에 이바지하고, 사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 자신을 살찌우니 대
개 천한 장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갑신 이전의 칙행조산(勅行造山)시에는 맡은 바가 스스로 중
하였으나, 갑신 이후에 조산의 규칙이 깨지자 우리 무리들도 곧 한산해지게 되었다.” 12)
문서의 보관자 이씨는 세습 11대에 이르는 무가(巫家)이며 현재 무녀 5명 재인(才人) 6명을
9) 조선시대 중국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사신을 일컫는 말. 칙사가 온다는 기별을 받으면 조정에서는 원접사나 선위
사를 보내 정중하게 마중했는데 대접이 지극히 융숭했다. 따라서 지금도 손님이 후한 대접을 받으면 '칙사 대접 받았
다'고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10) 조산위희란 산대(山臺)를 만들어 연희(演戱)한다는 뜻. 산대나례(山臺儺禮)는 조선조에 이루어지던 유희의 하나로 규식
지희의 성격과 광대소학지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이다. 전자는 주로 가무적 측면을 가지며, 후자는 주로 연극적 측
면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 산대나례를 관장하는 관청은 나례도감(儺禮都監) 또는 산대도감(山臺都監)으로 산대나례는 중
국사신 영접시 및 계동나례의시(季冬儺禮儀時) 등에 '규식지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그 종류도 다채로웠다.
산대나례에서는 이상의 '규식지희' 뿐만 아니라 '광대소학지희'의 화극적(話劇的)인 전개를 볼 수 있다. '광대소학지희'
에 대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 및 몇몇 문집에서 산견(散見)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잡희(雜戱), 노유희(老儒戱),
상소놀이, 좌수희(座首戱) 같은 것이 보인다. 아무튼 15∼16세기의 이 '광대소학지희'의 전개로 화극의 형태와 다수 인
물에 의한 연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이러한 산대나례는 나례도감의 공의(公儀)를 끼고 내려왔지만 그것이 일반민중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공
감을 자아내어 점차 일반화하여 갔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산대나례는 그 내용이 유학정신에 배치될 뿐더
러, 그것이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창우배(倡優輩)에 의해서 연출된다는 점과, 이를 거행함에 소용되는 경비가 막대
한 데서 나온 경제적인 이유로 개폐(改廢) 논의가 분분했다. 영·정조시대에 이르러 산대나례는 드디어 그 거행이 폐
지되고 창우들은 더욱 직업화되어 산대희(山臺戱)의 지방정착으로 산대도감 계통극의 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형성된 산대도감 계통극은 지방민들의 오락에 대한 수요와 공인(貢人)·사상(私商)·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경제의 후원으로 점점 뿌리를 박아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우는 의무.
12) 赤松智城·秋葉隆,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硏究 下』 , 東文選, 1991.
246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