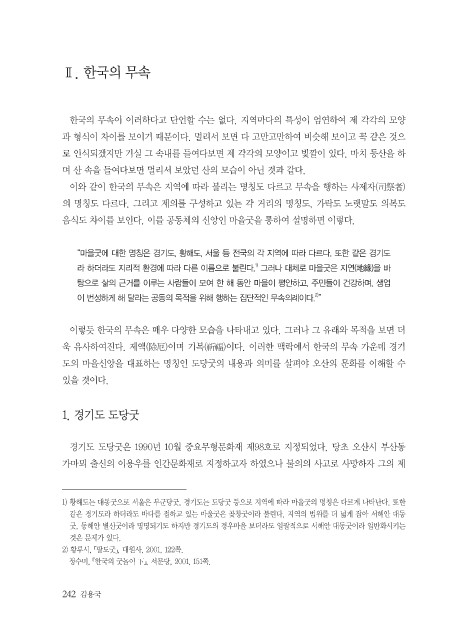Page 244 - 오산학 연구 1집
P. 244
Ⅱ. 한국의 무속
한국의 무속이 이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지역마다의 특성이 엄연하여 제 각각의 모양
과 형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면 다 고만고만하여 비슷해 보이고 꼭 같은 것으
로 인식되겠지만 기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 각각의 모양이고 빛깔이 있다. 마치 등산을 하
며 산 속을 들여다보면 멀리서 보았던 산의 모습이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속은 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도 다르고 무속을 행하는 사제자(司祭者)
의 명칭도 다르다. 그리고 제의를 구성하고 있는 각 거리의 명칭도, 가락도 노랫말도 의복도
음식도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공동체의 신앙인 마을굿을 통하여 설명하면 이렇다.
“마을굿에 대한 명칭은 경기도, 황해도, 서울 등 전국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한 같은 경기도
1)
라 하더라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대체로 마을굿은 지연(地緣)을 바
탕으로 삶의 근거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한 해 동안 마을이 평안하고, 주민들이 건강하며, 생업
2)
이 번성하게 해 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집단적인 무속의례이다. ”
이렇듯 한국의 무속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유래와 목적을 보면 더
욱 유사하여진다. 제액(除厄)이며 기복(祈福)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무속 가운데 경기
도의 마을신앙을 대표하는 명칭인 도당굿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야 오산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기도 도당굿
경기도 도당굿은 1990년 10월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다. 당초 오산시 부산동
가마뫼 출신의 이용우를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그의 제
1) 황해도는 대동굿으로 서울은 부군당굿, 경기도는 도당굿 등으로 지역에 따라 마을굿의 명칭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경기도라 하더라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마울굿은 곶창굿이라 불린다. 지역의 범위를 더 넓게 잡아 서해안 대동
굿, 동해안 별신굿이라 명명되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마을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서해안 대동굿이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황루시, 『팔도굿』, 대원사, 2001, 122쪽.
정수미, 『한국의 굿놀이 下』, 서문당, 2001, 151쪽.
242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