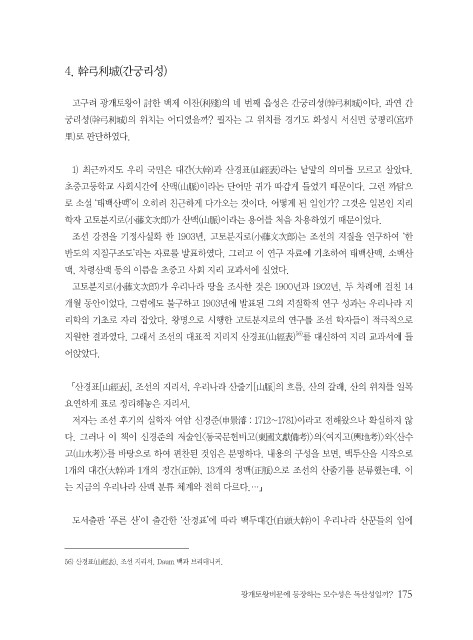Page 177 - 오산문화총서 8집
P. 177
4. 幹弓利城(간궁리성)
고구려 광개토왕이 討한 백제 이잔(利殘)의 네 번째 읍성은 간궁리성(幹弓利城)이다. 과연 간
궁리성(幹弓利城)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필자는 그 위치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宮坪
里)로 판단하였다.
1) 최근까지도 우리 국민은 대간(大幹)과 산경표(山經表)라는 낱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초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산맥(山脈)이라는 단어만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
로 소설 ‘태백산맥’이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일본인 지리
학자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산맥(山脈)이라는 용어를 처음 차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 강점을 기정사실화 한 1903년,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는 조선의 지질을 연구하여 ‘한
반도의 지질구조도’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태백산맥, 소백산
맥, 차령산맥 등의 이름을 초중고 사회 지리 교과서에 실었다.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우리나라 땅을 조사한 것은 1900년과 1902년, 두 차례에 걸친 14
개월 동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년에 발표된 그의 지질학적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지
리학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왕명으로 시행한 고토분지로의 연구를 조선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56)
지원한 결과였다. 그래서 조선의 대표적 지리지 산경표(山經表) 를 대신하여 지리 교과서에 들
어앉았다.
「산경표[山經表], 조선의 지리서, 우리나라 산줄기[山脈]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
요연하게 표로 정리해놓은 지리서.
저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申景濬:1712~1781)이라고 전해왔으나 확실하지 않
다. 그러나 이 책이 신경준의 저술인〈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여지고(輿地考)〉와〈산수
고(山水考)〉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된 것임은 분명하다. 내용의 구성을 보면, 백두산을 시작으로
1개의 대간(大幹)과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를 분류했는데, 이
는 지금의 우리나라 산맥 분류 체계와 전혀 다르다.…」
도서출판 ‘푸른 산’이 출간한 ‘산경표’에 따라 백두대간(白頭大幹)이 우리나라 산꾼들의 입에
56) 산경표(山經表), 조선 지리서, Daum 백과 브리태니커.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모수성은 독산성일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