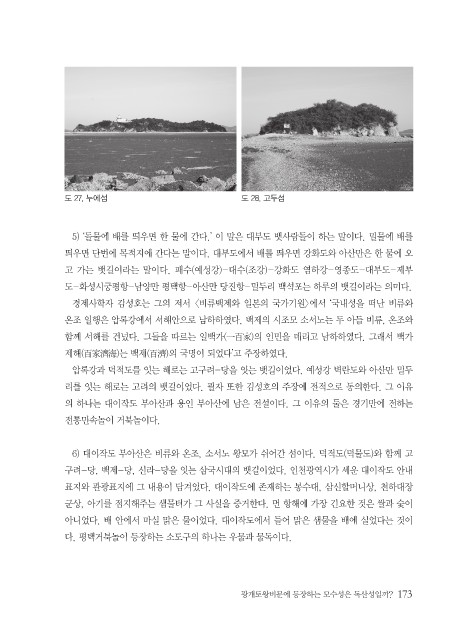Page 175 - 오산문화총서 8집
P. 175
도 27. 누에섬 도 28. 고두섬
5) ‘들물에 배를 띄우면 한 물에 간다.’ 이 말은 대부도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밀물에 배를
띄우면 단번에 목적지에 간다는 말이다. 대부도에서 배를 띄우면 강화도와 아산만은 한 물에 오
고 가는 뱃길이라는 말이다. 패수(예성강)-대수(조강)-강화도 염하강-영종도-대부도-제부
도-화성시궁평항-남양만 평택항-아산만 당진항-밀두리 백석포는 하루의 뱃길이라는 의미다.
경제사학자 김성호는 그의 저서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에서 ‘국내성을 떠난 비류와
온조 일행은 압록강에서 서해안으로 남하하였다.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는 두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서해를 건넜다. 그들을 따르는 일백가(一百家)의 인민을 데리고 남하하였다. 그래서 백가
제해(百家濟海)는 백제(百濟)의 국명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압록강과 덕적도를 잇는 해로는 고구려-당을 잇는 뱃길이었다. 예성강 벽란도와 아산만 밀두
리를 잇는 해로는 고려의 뱃길이었다. 필자 또한 김성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
의 하나는 대이작도 부아산과 용인 부아산에 남은 전설이다. 그 이유의 둘은 경기만에 전하는
전통민속놀이 거북놀이다.
6) 대이작도 부아산은 비류와 온조, 소서노 왕모가 쉬어간 섬이다. 덕적도(덕물도)와 함께 고
구려-당, 백제-당, 신라-당을 잇는 삼국시대의 뱃길이었다. 인천광역시가 세운 대이작도 안내
표지와 관광표지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대이작도에 존재하는 봉수대, 삼신할머니상, 천하대장
군상, 아기를 점지해주는 샘물터가 그 사실을 증거한다. 먼 항해에 가장 긴요한 것은 쌀과 숯이
아니었다. 배 안에서 마실 맑은 물이었다. 대이작도에서 들어 맑은 샘물을 배에 실었다는 것이
다. 평택거북놀이 등장하는 소도구의 하나는 우물과 물독이다.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모수성은 독산성일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