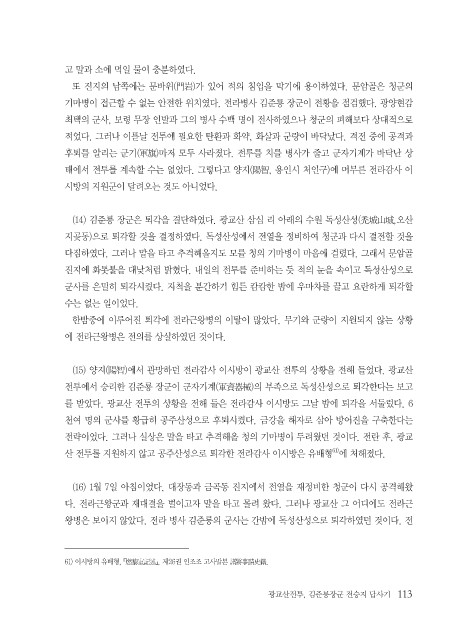Page 115 - 오산문화총서 7집
P. 115
고 말과 소에 먹일 물이 충분하였다.
또 진지의 남쪽에는 문바위(門岩)가 있어 적의 침입을 막기에 용이하였다. 문암골은 청군의
기마병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위치였다. 전라병사 김준룡 장군이 전황을 점검했다. 광양현감
최택의 군사, 보령 무장 인발과 그의 병사 수백 명이 전사하였으나 청군의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튿날 전투에 필요한 탄환과 화약, 화살과 군량이 바닥났다. 격전 중에 공격과
후퇴를 알리는 군기(軍旗)마저 모두 사라졌다. 전투를 치를 병사가 줄고 군자기계가 바닥난 상
태에서 전투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양지(陽智, 용인시 처인구)에 머무른 전라감사 이
시방의 지원군이 달려오는 것도 아니었다.
(14) 김준룡 장군은 퇴각을 결단하였다. 광교산 삼십 리 아래의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오산
지곶동)으로 퇴각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성산성에서 전열을 정비하여 청군과 다시 결전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말을 타고 추격해올지도 모를 청의 기마병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문암골
진지에 화톳불을 대낮처럼 밝혔다.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는 듯 적의 눈을 속이고 독성산성으로
군사를 은밀히 퇴각시켰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든 캄캄한 밤에 우마차를 끌고 요란하게 퇴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밤중에 이루어진 퇴각에 전라근왕병의 이탈이 많았다. 무기와 군량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
에 전라근왕병은 전의를 상실하였던 것이다.
(15) 양지(陽智)에서 관망하던 전라감사 이시방이 광교산 전투의 상황을 전해 들었다.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한 김준룡 장군이 군자기계(軍資器械)의 부족으로 독성산성으로 퇴각한다는 보고
를 받았다. 광교산 전투의 상황을 전해 들은 전라감사 이시방도 그날 밤에 퇴각을 서둘렀다. 6
천여 명의 군사를 황급히 공주산성으로 후퇴시켰다. 금강을 해자로 삼아 방어진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말을 타고 추격해올 청의 기마병이 두려웠던 것이다. 전란 후, 광교
61)
산 전투를 지원하지 않고 공주산성으로 퇴각한 전라감사 이시방은 유배형 에 처해졌다.
(16) 1월 7일 아침이었다. 대장동과 금곡동 진지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청군이 다시 공격해왔
다. 전라근왕군과 재대결을 벌이고자 말을 타고 몰려 왔다. 그러나 광교산 그 어디에도 전라근
왕병은 보이지 않았다. 전라 병사 김준룡의 군사는 간밤에 독성산성으로 퇴각하였던 것이다. 전
61) 이시방의 유배형, 『燃藜室記述』, 제26권 인조조 고사말본 諸將事蹟史籍.
광교산전투, 김준룡장군 전승지 답사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