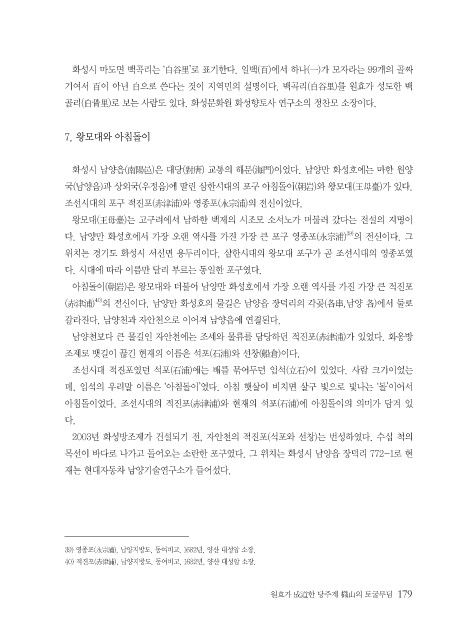Page 181 - 오산학 연구 4집
P. 181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는 ‘白谷里’로 표기한다. 일백(百)에서 하나(一)가 모자라는 99개의 골짜
기여서 百이 아닌 白으로 쓴다는 것이 지역민의 설명이다. 백곡리(白谷里)를 원효가 성도한 백
골리(白骨里)로 보는 사람도 있다. 화성문화원 화성향토사 연구소의 정찬모 소장이다.
7. 왕모대와 아침돌이
화성시 남양읍(南陽邑)은 대당(對唐) 교통의 해문(海門)이었다. 남양만 화성호에는 마한 원양
국(남양읍)과 상외국(우정읍)에 딸린 삼한시대의 포구 아침돌이(朝岩)와 왕모대(王母臺)가 있다.
조선시대의 포구 적진포(赤津浦)와 영종포(永宗浦)의 전신이었다.
왕모대(王母臺)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가 머물러 갔다는 전설의 지명이
39)
다. 남양만 화성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큰 포구 영종포(永宗浦) 의 전신이다. 그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이다. 삼한시대의 왕모대 포구가 곧 조선시대의 영종포였
다. 시대에 따라 이름만 달리 부르는 동일한 포구였다.
아침돌이(朝岩)은 왕모대와 더불어 남양만 화성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큰 적진포
40)
(赤津浦) 의 전신이다. 남양만 화성호의 물길은 남양읍 장덕리의 각곶(各串,남양 各)에서 둘로
갈라진다. 남양천과 자안천으로 이어져 남양읍에 연결된다.
남양천보다 큰 물길인 자안천에는 조세와 물류를 담당하던 적진포(赤津浦)가 있었다. 화옹방
조제로 뱃길이 끊긴 현재의 이름은 석포(石浦)와 선창(船倉)이다.
조선시대 적진포였던 석포(石浦)에는 배를 묶어두던 입석(立石)이 있었다. 사람 크기이었는
데, 입석의 우리말 이름은 ‘아침돌이’였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살구 빛으로 빛나는 ‘돌’이어서
아침돌이었다. 조선시대의 적진포(赤津浦)와 현재의 석포(石浦)에 아침돌이의 의미가 담겨 있
다.
2003년 화성방조제가 건설되기 전, 자안천의 적진포(석포와 선창)는 번성하였다. 수십 척의
목선이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는 소란한 포구였다. 그 위치는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772-1로 현
재는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가 들어섰다.
39) 영종포(永宗浦), 남양지방도, 동여비고, 1682년, 양산 대성암 소장.
40) 적진포(赤津浦), 남양지방도, 동여비고, 1682년, 양산 대성암 소장.
원효가 成道한 당주계 樴山의 토굴무덤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