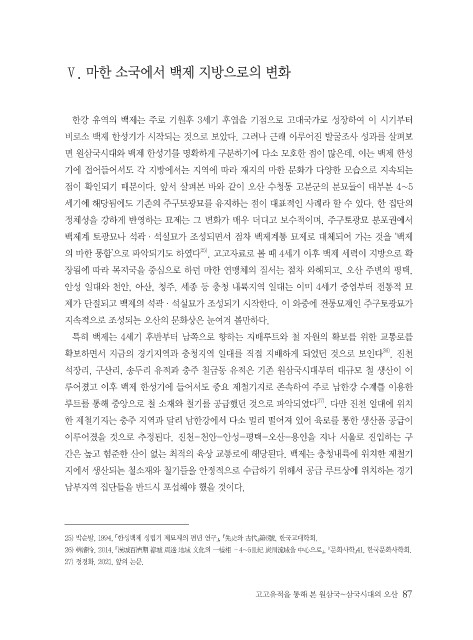Page 89 - 오산문화총서 8집
P. 89
Ⅴ. 마한 소국에서 백제 지방으로의 변화
한강 유역의 백제는 주로 기원후 3세기 후엽을 기점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여 이 시기부터
비로소 백제 한성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 이루어진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
면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다소 모호한 점이 많은데, 이는 백제 한성
기에 접어들어서도 각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재지의 마한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산 수청동 고분군의 분묘들이 대부분 4~5
세기에 해당됨에도 기존의 주구토광묘를 유지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 집단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묘제는 그 변화가 매우 더디고 보수적이며, 주구토광묘 분포권에서
백제계 토광묘나 석곽·석실묘가 조성되면서 점차 백제계통 묘제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백제
25)
의 마한 통합’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 고고자료로 볼 때 4세기 이후 백제 세력이 지방으로 확
장됨에 따라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던 마한 연맹체의 질서는 점차 와해되고, 오산 주변의 평택,
안성 일대와 천안, 아산, 청주, 세종 등 충청 내륙지역 일대는 이미 4세기 중엽부터 전통적 묘
제가 단절되고 백제의 석곽·석실묘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 전통묘제인 주구토광묘가
지속적으로 조성되는 오산의 문화상은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남쪽으로 향하는 지배루트와 철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교통로를
26)
확보하면서 지금의 경기지역과 충청지역 일대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진천
석장리, 구산리, 송두리 유적과 충주 칠금동 유적은 기존 원삼국시대부터 대규모 철 생산이 이
루어졌고 이후 백제 한성기에 들어서도 중요 제철기지로 존속하여 주로 남한강 수계를 이용한
27)
루트를 통해 중앙으로 철 소재와 철기를 공급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진천 일대에 위치
한 제철기지는 충주 지역과 달리 남한강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육로를 통한 생산품 공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천안-안성-평택-오산-용인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구
간은 높고 험준한 산이 없는 최적의 육상 교통로에 해당된다. 백제는 충청내륙에 위치한 제철기
지에서 생산되는 철소재와 철기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공급 루트상에 위치하는 경기
남부지역 집단들을 반드시 포섭해야 했을 것이다.
25) 박순발, 1994, 「한성백제 성립기 제묘제의 편년 연구」, 『先史와 古代』第6號, 한국고대학회.
26) 韓濬怜, 2014, 「漢城百濟期 都城 周邊 地域 文化의 一樣相 –4~5世紀 炭川流域을 中心으로」, 『문화사학』41, 한국문화사학회.
27) 정경화, 2021, 앞의 논문.
고고유적을 통해 본 원삼국~삼국시대의 오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