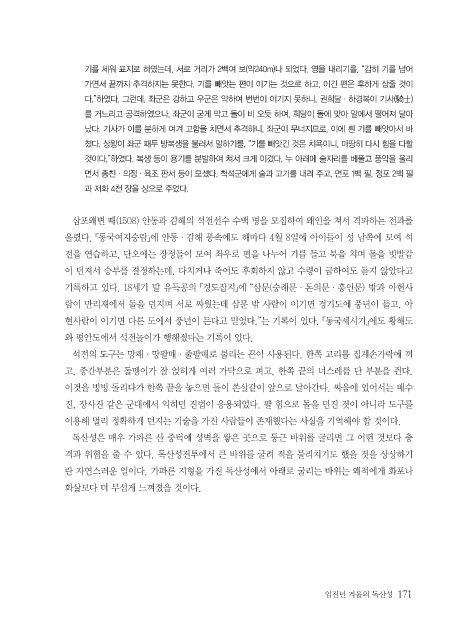Page 173 - 오산학 연구 6집
P. 173
기를 세워 표지로 하였는데, 서로 거리가 2백여 보(약240m)나 되었다. 영을 내리기를, “감히 기를 넘어
가면서 끝까지 추격하지는 못한다. 기를 빼앗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이긴 편은 후하게 상줄 것이
다.”하였다. 그런데, 좌군은 강하고 우군은 약하여 번번이 이기지 못하니, 권희달·하경복이 기사(騎士)
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좌군이 굳게 막고 돌이 비 오듯 하여, 희달이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달아
났다. 기사가 이를 분하게 여겨 고함을 치면서 추격하니, 좌군이 무너지므로, 이에 흰 기를 빼앗아서 바
쳤다. 상왕이 좌군 패두 방복생을 불러서 말하기를, “기를 빼앗긴 것은 치욕이니, 마땅히 다시 힘을 다할
것이다.”하였다. 복생 등이 용기를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누 아래에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
면서 종친·의정·육조 판서 등이 모셨다. 척석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면포 1백 필, 정포 2백 필
과 저화 4천 장을 상으로 주었다.
삼포왜변 때(1508) 안동과 김해의 석전선수 수백 명을 모집하여 왜인을 쳐서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동국여지승람』에 안동·김해 풍속에도 해마다 4월 8일에 아이들이 성 남쪽에 모여 석
전을 연습하고, 단오에는 장정들이 모여 좌우로 편을 나누어 기를 들고 북을 치며 돌을 빗발같
이 던져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다치거나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 수령이 금하여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8세기 말 유득공의 『경도잡지』에 “삼문(숭례문·돈의문·흥인문) 밖과 아현사
람이 만리재에서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웠는데 삼문 밖 사람이 이기면 경기도에 풍년이 들고, 아
현사람이 이기면 다른 도에서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다. 『동국세시기』에도 황해도
와 평안도에서 석전놀이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석전의 도구는 망패·망팔매·줄팔매로 불리는 끈이 사용된다. 한쪽 고리를 집게손가락에 끼
고, 중간부분은 돌멩이가 잘 얹히게 여러 가닥으로 펴고, 한쪽 끝의 너스레를 단 부분을 쥔다.
이것을 빙빙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쏜살같이 앞으로 날아간다. 싸움에 있어서는 배수
진, 장사진 같은 군대에서 익히던 진법이 응용되었다. 팔 힘으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 멀리 정확하게 던지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산성은 매우 가파른 산 중턱에 성벽을 쌓은 곳으로 둥근 바위를 굴리면 그 어떤 것보다 충
격과 위협을 줄 수 있다. 독산성전투에서 큰 바위를 굴려 적을 물리치기도 했을 것을 상상하기
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파른 지형을 가진 독산성에서 아래로 굴리는 바위는 왜적에게 화포나
화살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것이다.
임진년 겨울의 독산성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