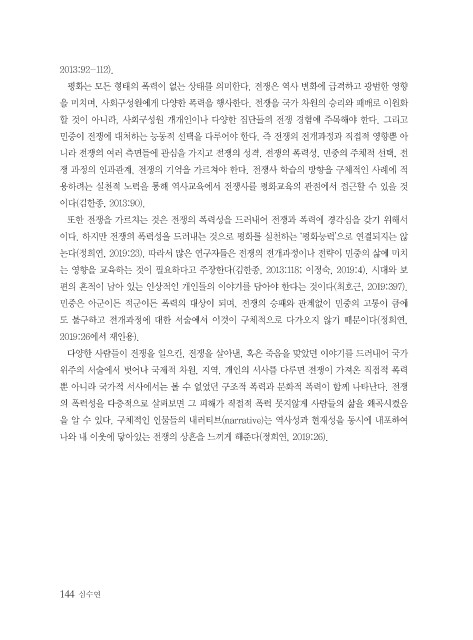Page 146 - 오산학 연구 6집
P. 146
2013:92-112).
평화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쟁은 역사 변화에 급격하고 광범한 영향
을 미치며, 사회구성원에게 다양한 폭력을 행사한다. 전쟁을 국가 차원의 승리와 패배로 이원화
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이나 다양한 집단들의 전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민중이 전쟁에 대처하는 능동적 선택을 다루어야 한다. 즉 전쟁의 전개과정과 직접적 영향뿐 아
니라 전쟁의 여러 측면들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의 성격, 전쟁의 폭력성, 민중의 주체적 선택, 전
쟁 과정의 인과관계, 전쟁의 기억을 가르쳐야 한다. 전쟁사 학습의 방향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
용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 역사교육에서 전쟁사를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김한종, 2013:90).
또한 전쟁을 가르치는 것은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어 전쟁과 폭력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능력’으로 연결되지는 않
는다(정희연, 2019:23).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전쟁의 전개과정이나 전략이 민중의 삶에 미치
는 영향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한종, 2013:118; 이정숙, 2019:4). 시대와 보
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인상적인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최호근, 2019:397).
민중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폭력의 대상이 되며,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중의 고통이 큼에
도 불구하고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정희연,
2019:26에서 재인용).
다양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을 살아낸, 혹은 죽음을 맞았던 이야기를 드러내어 국가
위주의 서술에서 벗어나 국제적 차원, 지역, 개인의 서사를 다루면 전쟁이 가져온 직접적 폭력
뿐 아니라 국가적 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함께 나타난다. 전쟁
의 폭력성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면 그 피해가 직접적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의 삶을 왜곡시켰음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인물들의 내러티브(narrative)는 역사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내포하여
나와 내 이웃에 닿아있는 전쟁의 상흔을 느끼게 해준다(정희연, 2019:26).
144 심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