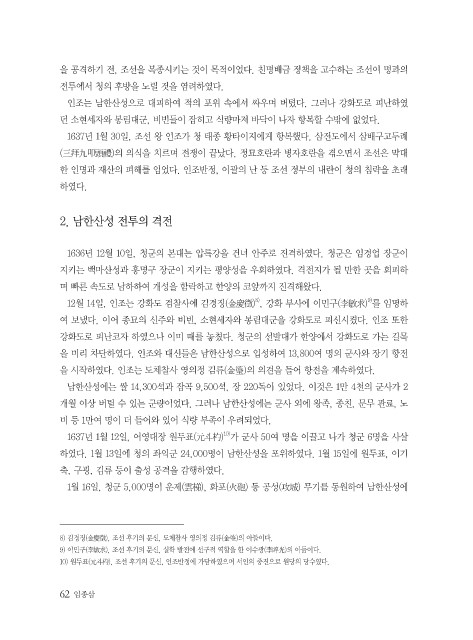Page 64 - 오산문화총서 7집
P. 64
을 공격하기 전, 조선을 복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친명배금 정책을 고수하는 조선이 명과의
전투에서 청의 후방을 노릴 것을 염려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대피하여 적의 포위 속에서 싸우며 버텼다. 그러나 강화도로 피난하였
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비빈들이 잡히고 식량마저 바닥이 나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왕 인조가 청 태종 황타이지에게 항복했다.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례
(三拜九叩頭禮)의 의식을 치르며 전쟁이 끝났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막대
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 인조반정, 이괄의 난 등 조선 정부의 내란이 청의 침략을 초래
하였다.
2. 남한산성 전투의 격전
1636년 12월 10일, 청군의 본대는 압록강을 건너 안주로 진격하였다. 청군은 임경업 장군이
지키는 백마산성과 홍명구 장군이 지키는 평양성을 우회하였다. 격전지가 될 만한 곳을 회피하
며 빠른 속도로 남하하여 개성을 함락하고 한양의 코앞까지 진격해왔다.
9)
8)
12월 14일, 인조는 강화도 검찰사에 김경징(金慶徵) , 강화 부사에 이민구(李敏求) 를 임명하
여 보냈다. 이어 종묘의 신주와 비빈,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강화도로 피신시켰다. 인조 또한
강화도로 피난코자 하였으나 이미 때를 놓쳤다. 청군의 선발대가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
을 미리 차단하였다. 인조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입성하여 13,800여 명의 군사와 장기 항전
을 시작하였다. 인조는 도체찰사 영의정 김류(金瑬)의 의견을 들어 항전을 계속하였다.
남한산성에는 쌀 14,300석과 잡곡 9,500석, 장 220독이 있었다. 이것은 1만 4천의 군사가 2
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군량이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는 군사 외에 왕족, 종친, 문무 관료, 노
비 등 1만여 명이 더 들어와 있어 식량 부족이 우려되었다.
10)
1637년 1월 12일, 어영대장 원두표(元斗杓) 가 군사 50여 명을 이끌고 나가 청군 6명을 사살
하였다. 1월 13일에 청의 좌익군 24,000명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1월 15일에 원두표, 이기
축, 구굉, 김류 등이 출성 공격을 감행하였다.
1월 16일, 청군 5,000명이 운제(雲梯), 화포(火砲) 등 공성(攻城) 무기를 동원하여 남한산성에
8) 김경징(金慶徵), 조선 후기의 문신, 도체찰사 영의정 김류(金瑬)의 아들이다.
9) 이민구(李敏求),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이다.
10) 원두표(元斗杓), 조선 후기의 문신, 인조반정에 가담하였으며 서인의 중진으로 원당의 당수였다.
62 임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