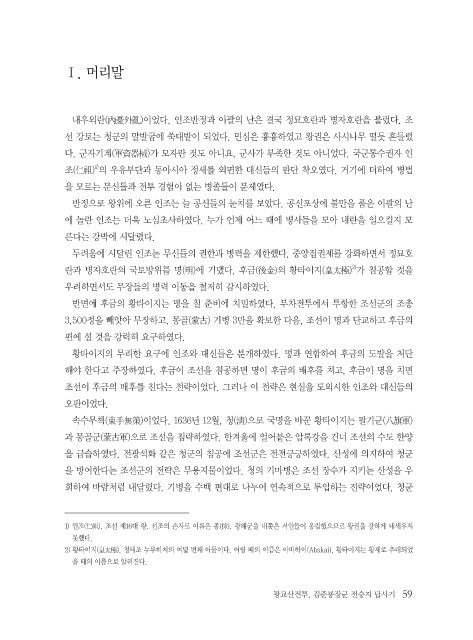Page 61 - 오산문화총서 7집
P. 61
Ⅰ. 머리말
내우외란(內憂外亂)이었다.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은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렀다. 조
선 강토는 청군의 말발굽에 쑥대밭이 되었다. 민심은 흉흉하였고 왕권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
다. 군자기계(軍資器械)가 모자란 것도 아니요, 군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국군통수권자 인
1)
조(仁祖) 의 우유부단과 동아시아 정세를 외면한 대신들의 판단 착오였다. 거기에 더하여 병법
을 모르는 문신들과 전투 경험이 없는 병졸들이 문제였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늘 공신들의 눈치를 보았다. 공신포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
에 놀란 인조는 더욱 노심초사하였다. 누가 언제 어느 때에 병사들을 모아 내란을 일으킬지 모
른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두려움에 시달린 인조는 무신들의 권한과 병력을 제한했다.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면서 정묘호
2)
란과 병자호란의 국토방위를 명(明)에 기댔다. 후금(後金)의 황타이지(皇太極) 가 침공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무장들의 병력 이동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반면에 후금의 황타이지는 명을 칠 준비에 치밀하였다. 부차전투에서 투항한 조선군의 조총
3,500정을 빼앗아 무장하고, 몽골(蒙古) 기병 3만을 확보한 다음, 조선이 명과 단교하고 후금의
편에 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황타이지의 무리한 요구에 인조와 대신들은 분개하였다. 명과 연합하여 후금의 도발을 처단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면 명이 후금의 배후를 치고, 후금이 명을 치면
조선이 후금의 배후를 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현실을 도외시한 인조와 대신들의
오판이었다.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1636년 12월, 청(淸)으로 국명을 바꾼 황타이지는 팔기군(八旗軍)
과 몽골군(蒙古軍)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수도 한양
을 급습하였다. 전광석화 같은 청군의 침공에 조선군은 전전긍긍하였다. 산성에 의지하여 청군
을 방어한다는 조선군의 전략은 무용지물이었다. 청의 기마병은 조선 장수가 지키는 산성을 우
회하여 바람처럼 내달렸다. 기병을 수백 편대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었다. 청군
1) 인조(仁祖), 조선 제16대 왕, 선조의 손자로 이름은 종(倧), 광해군을 내쫓은 서인들이 옹립했으므로 왕권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했다.
2) 황타이지(皇太極), 청태조 누루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이다. 어릴 때의 이름은 아바하이(Abakai), 황타이지는 황제로 추대되었
을 때의 이름으로 알려진다.
광교산전투, 김준룡장군 전승지 답사기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