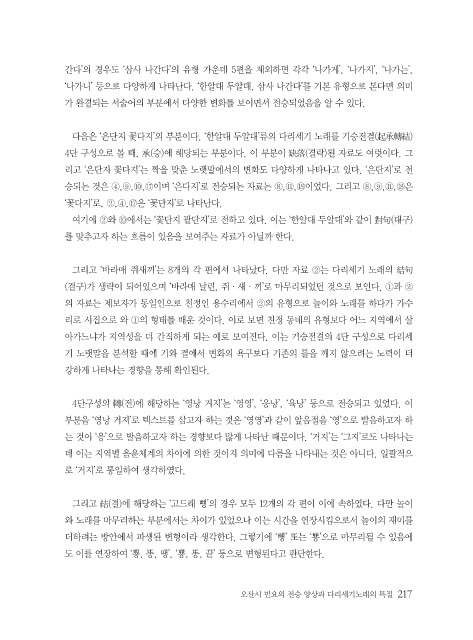Page 219 - 오산문화총서 7집
P. 219
간다’의 경우도 ‘삼사 나간다’의 유형 가운데 5편을 제외하면 각각 ‘나가게’, ‘나가지’, ‘나가는’,
‘나가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나간다’를 기본 유형으로 본다면 의미
가 완결되는 서술어의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은단지 꽃다지’의 부분이다. ‘한알대 두알대’류의 다리세기 노래를 기승전결(起承轉結)
4단 구성으로 볼 때, 承(승)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缺落(결락)된 자료도 여럿이다. 그
리고 ‘은단지 꽃다지’는 짝을 맞춘 노랫말에서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단지’로 전
승되는 것은 ④,⑨,⑩,⑰이며 ‘은다지’로 전승되는 자료는 ⑧,⑪,⑱이었다. 그리고 ⑧,⑨,⑪,⑱은
‘꽃다지’로, ②,④,⑰은 ‘꽃단지’로 나타난다.
여기에 ②와 ⑩에서는 ‘꽃단지 팥단지’로 전하고 있다. 이는 ‘한알대 두알대’와 같이 對句(대구)
를 맞추고자 하는 흐름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바라매 쥐새끼’는 8개의 각 편에서 나타났다. 다만 자료 ②는 다리세기 노래의 結句
(결구)가 생략이 되어있으며 ‘바라매 날린, 쥐·새·끼’로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과 ②
의 자료는 제보자가 동일인으로 친정인 용수리에서 ②의 유형으로 놀이와 노래를 하다가 가수
리로 시집으로 와 ①의 형태를 배운 것이다. 이로 보면 친정 동네의 유형보다 어느 지역에서 살
아가느냐가 지역성을 더 간직하게 되는 예로 보여진다. 이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다리세
기 노랫말을 분석할 때에 기와 결에서 변화의 욕구보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통해 확인된다.
4단구성의 轉(전)에 해당하는 ‘영낭 거지’는 ‘영영’, ‘응낭’, ‘육낭’ 등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영낭 거지’로 텍스트를 삼고자 하는 것은 ‘영영’과 같이 앞음절을 ‘영’으로 발음하고자 하
는 것이 ‘응’으로 발음하고자 하는 경향보다 많게 나타난 때문이다. ‘거지’는 ‘그지’로도 나타나는
데 이는 지역별 음운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의미에 다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일괄적으
로 ‘거지’로 통일하여 생각하였다.
그리고 結(결)에 해당하는 ‘고드래 뼝’의 경우 모두 12개의 각 편이 이에 속하였다. 다만 놀이
와 노래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서 놀이의 재미를
더하려는 방안에서 파생된 변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뼝’ 또는 ‘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에
도 이를 연장하여 ‘뿅, 똥, 땡’, ‘뿅, 똥, 끝’ 등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한다.
오산시 민요의 전승 양상과 다리세기노래의 특질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