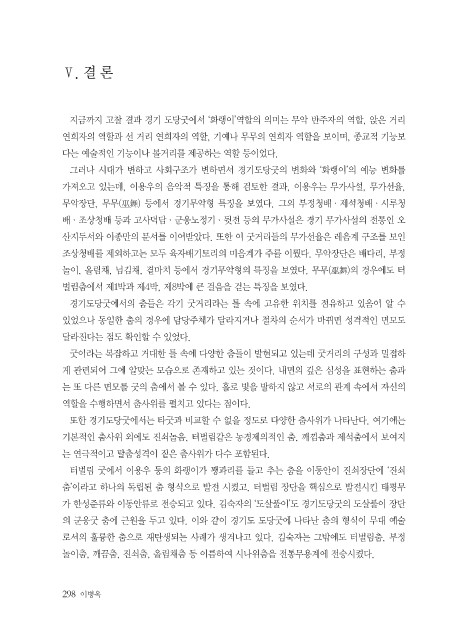Page 300 - 오산학 연구 1집
P. 300
Ⅴ. 결 론
지금까지 고찰 결과 경기 도당굿에서 ‘화랭이’역할의 의미는 무악 반주자의 역할, 앉은 거리
연희자의 역할과 선 거리 연희자의 역할, 기예나 무무의 연희자 역할을 보이며, 종교적 기능보
다는 예술적인 기능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등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경기도당굿의 변화와 ‘화랭이’의 예능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용우의 음악적 특징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용우는 무가사설, 무가선율,
무악장단, 무무(巫舞) 등에서 경기무악형 특징을 보였다. 그의 부정청배ㆍ제석청배ㆍ시루청
배ㆍ조상청배 등과 고사덕담ㆍ군웅노정기ㆍ뒷전 등의 무가사설은 경기 무가사설의 전통인 오
산지두서와 이종만의 문서를 이어받았다. 또한 이 굿거리들의 무가선율은 레음계 구조를 보인
조상청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육자배기토리의 미음계가 주를 이뤘다. 무악장단은 배다리, 부정
놀이, 올림채, 넘김채, 곁마치 등에서 경기무악형의 특징을 보였다. 무무(巫舞)의 경우에도 터
벌림춤에서 제1박과 제4박, 제8박에 큰 걸음을 걷는 특징을 보였다.
경기도당굿에서의 춤들은 각기 굿거리라는 틀 속에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이 알 수
있었으나 동일한 춤의 경우에 담당주체가 달라지거나 절차의 순서가 바뀌면 성격적인 면모도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굿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틀 속에 다양한 춤들이 발현되고 있는데 굿거리의 구성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그에 알맞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깊은 심성을 표현하는 춤과
는 또 다른 면모를 굿의 춤에서 볼 수 있다. 홀로 빛을 발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당굿에서는 타굿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춤사위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춤사위 외에도 진쇠놀음, 터벌림같은 농경제의적인 춤, 깨낌춤과 제석춤에서 보여지
는 연극적이고 탈춤성격이 짙은 춤사위가 다수 포함된다.
터벌림 굿에서 이용우 등의 화랭이가 꽹과리를 들고 추는 춤을 이동안이 진쇠장단에 ‘진쇠
춤’이라고 하나의 독립된 춤 형식으로 발전 시켰고, 터벌림 장단을 핵심으로 발전시킨 태평무
가 한성준류와 이동안류로 전승되고 있다. 김숙자의 ‘도살풀이’도 경기도당굿의 도살풀이 장단
의 군웅굿 춤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 도당굿에 나타난 춤의 형식이 무대 예술
로서의 훌륭한 춤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김숙자는 그밖에도 터벌림춤, 부정
놀이춤, 깨끔춤, 진쇠춤, 올림채춤 등 이름하여 시나위춤을 전통무용계에 전승시켰다.
298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