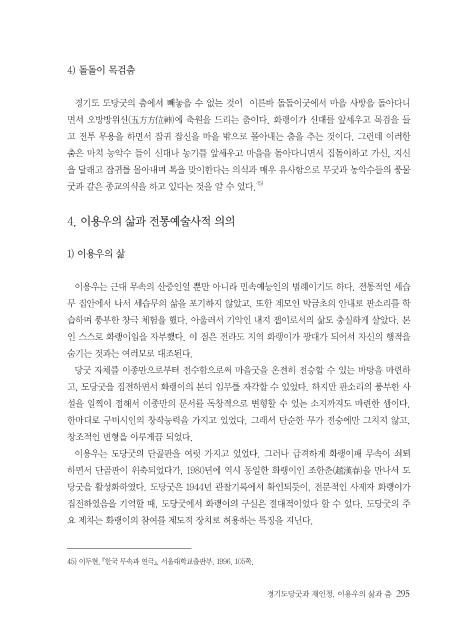Page 297 - 오산학 연구 1집
P. 297
4) 돌돌이 목검춤
경기도 도당굿의 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돌돌이굿에서 마을 사방을 돌아다니
면서 오방방위신(五方方位神)에 축원을 드리는 춤이다. 화랭이가 신대를 앞세우고 목검을 들
고 전투 무용을 하면서 잡귀 잡신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는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춤은 마치 농악수 들이 신대나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돌이하고 가신, 지신
을 달래고 잡귀를 몰아내며 복을 맞이한다는 의식과 매우 유사함으로 무굿과 농악수들의 풍물
굿과 같은 종교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4. 이용우의 삶과 전통예술사적 의의
1) 이용우의 삶
이용우는 근대 무속의 산증인일 뿐만 아니라 민속예능인의 범례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세습
무 집안에서 나서 세습무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계모인 박금초의 안내로 판소리를 학
습하며 풍부한 창극 체험을 했다. 아울러서 기악인 내지 잽이로서의 삶도 충실하게 살았다. 본
인 스스로 화랭이임을 자부했다. 이 점은 전라도 지역 화랭이가 광대가 되어서 자신의 행적을
숨기는 것과는 여러모로 대조된다.
당굿 자체를 이종만으로부터 전수함으로써 마을굿을 온전히 전승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고, 도당굿을 집전하면서 화랭이의 본디 임무를 자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판소리의 풍부한 사
설을 일찍이 접해서 이종만의 문서를 독창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소지까지도 마련한 셈이다.
한마디로 구비시인의 창작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단순한 무가 전승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적인 변형을 이루게끔 되었다.
이용우는 도당굿의 단골판을 여럿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화랭이패 무속이 쇠퇴
하면서 단골판이 위축되었다가, 1980년에 역시 동일한 화랭이인 조한춘(趙漢春)을 만나서 도
당굿을 활성화하였다. 도당굿은 1944년 관찰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전문적인 사제자 화랭이가
집전하였음을 기억할 때, 도당굿에서 화랭이의 구실은 절대적이었다 할 수 있다. 도당굿의 주
요 제차는 화랭이의 참여를 제도적 장치로 허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45) 이두현, 『한국 무속과 연극』,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05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