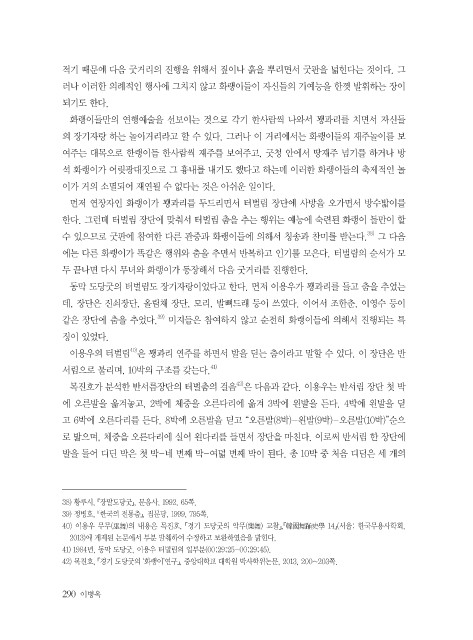Page 292 - 오산학 연구 1집
P. 292
적기 때문에 다음 굿거리의 진행을 위해서 짚이나 흙을 뿌리면서 굿판을 넓힌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화랭이들이 자신들의 기예능을 한껏 발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화랭이들만의 연행예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각기 한사람씩 나와서 꽹과리를 치면서 자신들
의 장기자랑 하는 놀이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리에서는 화랭이들의 재주놀이를 보
여주는 대목으로 한랭이들 한사람씩 재주를 보여주고, 굿청 안에서 땅재주 넘기를 하거나 방
석 화랭이가 어릿광대짓으로 그 흉내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화랭이들의 축제적인 놀
이가 거의 소멸되어 재연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먼저 연장자인 화랭이가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터벌림 장단에 사방을 오가면서 방수밟이를
한다. 그런데 터벌림 장단에 맞춰서 터벌림 춤을 추는 행위는 예능에 숙련된 화랭이 들만이 할
38)
수 있으므로 굿판에 참여한 다른 관중과 화랭이들에 의해서 칭송과 찬미를 받는다. 그 다음
에는 다른 화랭이가 똑같은 행위와 춤을 추면서 반복하고 인기를 모은다. 터벌림의 순서가 모
두 끝나면 다시 무녀와 화랭이가 등장해서 다음 굿거리를 진행한다.
동막 도당굿의 터벌림도 장기자랑이었다고 한다. 먼저 이용우가 꽹과리를 들고 춤을 추었는
데, 장단은 진쇠장단, 올림채 장단, 모리, 발뼈드래 등이 쓰였다. 이어서 조한춘, 이영수 등이
39)
같은 장단에 춤을 추었다. 미지들은 참여하지 않고 순전히 화랭이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
징이 있었다.
40)
이용우의 터벌림 은 꽹과리 연주를 하면서 발을 딛는 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단은 반
서림으로 불리며, 10박의 구조를 갖는다. 41)
42)
목진호가 분석한 반서름장단의 터벌춤의 걸음 은 다음과 같다. 이용우는 반서림 장단 첫 박
에 오른발을 옮겨놓고, 2박에 체중을 오른다리에 옮겨 3박에 왼발을 든다. 4박에 왼발을 딛
고 6박에 오른다리를 든다. 8박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8박)-왼발(9박)-오른발(10박)”순으
로 밟으며, 체중을 오른다리에 실어 왼다리를 들면서 장단을 마친다. 이로써 반서림 한 장단에
발을 들어 디딘 박은 첫 박-네 번째 박-여덟 번째 박이 된다. 총 10박 중 처음 디딤은 세 개의
38) 황루시, 『장말도당굿』, 문음사, 1992, 65쪽.
39) 정병호, 『한국의 전통춤』, 집문당, 1999, 795쪽.
40) 이용우 무무(巫舞)의 내용은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악무(樂舞) 고찰」,『韓國舞踊史學 14』(서울: 한국무용사학회,
2013)에 게제된 논문에서 부분 발췌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41) 1984년, 동막 도당굿, 이용우 터벌림의 일부분(00;29;25-00;29;45).
42) 목진호, 「경기 도당굿의 ‘화랭이’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00~203쪽.
290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