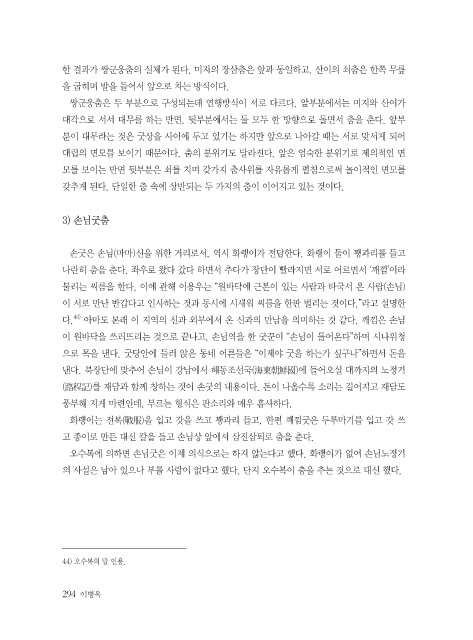Page 296 - 오산학 연구 1집
P. 296
한 결과가 쌍군웅춤의 실체가 된다. 미지의 장삼춤은 앞과 동일하고, 산이의 쇠춤은 한쪽 무릎
을 굽히며 발을 들어서 앞으로 차는 방식이다.
쌍군웅춤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연행방식이 서로 다르다. 앞부분에서는 미지와 산이가
대각으로 서서 대무를 하는 반면, 뒷부분에서는 둘 모두 한 방향으로 돌면서 춤을 춘다. 앞부
분이 대무라는 것은 굿상을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는 서로 맞서게 되어
대립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춤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앞은 엄숙한 분위기로 제의적인 면
모를 보이는 반면 뒷부분은 쇠를 치며 갖가지 춤사위를 자유롭게 펼침으로써 놀이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단일한 춤 속에 상반되는 두 가지의 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손님굿춤
손굿은 손님(마마)신을 위한 거리로서, 역시 화랭이가 전담한다. 화랭이 둘이 꽹과리를 들고
나란히 춤을 춘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다가 장단이 빨라지면 서로 어르면서 ‘깨낌’이라
불리는 씨름을 한다. 이에 관해 이용우는 “원바닥에 근본이 있는 사람과 타국서 온 사람(손님)
이 서로 만난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새워 씨름을 한판 벌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44)
다. 아마도 본래 이 지역의 신과 외부에서 온 신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깨낌은 손님
이 원바닥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고, 손님역을 한 굿꾼이 “손님이 들어온다”하며 시나위청
으로 목을 낸다. 굿당안에 들러 앉은 동네 어른들은 “이제야 굿을 하는가 싶구나”하면서 돈을
낸다. 북장단에 맞추어 손님이 강남에서 해동조선국(海東朝鮮國)에 들어오실 대까지의 노정기
(路程記)를 재담과 함께 창하는 것이 손굿의 내용이다. 돈이 나올수록 소리는 길어지고 재담도
풍부해 지게 마련인데, 부르는 형식은 판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화랭이는 전복(戰服)을 입고 갓을 쓰고 꽹과리 들고, 한편 깨낌굿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 쓰
고 종이로 만든 대신 칼을 들고 손님상 앞에서 삼진삼퇴로 춤을 춘다.
오수복에 의하면 손님굿은 이제 의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화랭이가 없어 손님노정기
의 사설은 남아 있으나 부를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단지 오수복이 춤을 추는 것으로 대신 했다.
44) 오수복의 말 인용.
294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