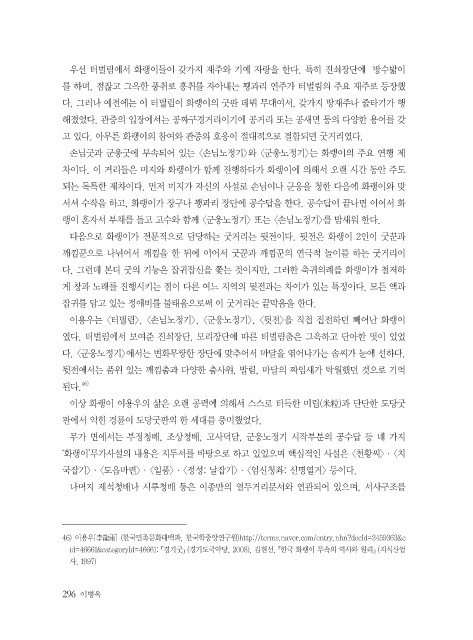Page 298 - 오산학 연구 1집
P. 298
우선 터벌림에서 화랭이들이 갖가지 재주와 기예 자랑을 한다. 특히 진쇠장단에 방수밟이
를 하며, 점잖고 그윽한 풍취로 흥취를 자아내는 꽹과리 연주가 터벌림의 주요 재주로 등장했
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터벌림이 화랭이의 굿판 데뷔 무대여서, 갖가지 땅재주나 줄타기가 행
해졌었다. 관중의 입장에서는 공짜구경거리이기에 공거리 또는 공새면 등의 다양한 용어를 갖
고 있다. 아무튼 화랭이의 참여와 관중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결합되던 굿거리였다.
손님굿과 군웅굿에 부속되어 있는 <손님노정기>와 <군웅노정기>는 화랭이의 주요 연행 제
차이다. 이 거리들은 미지와 화랭이가 함께 진행하다가 화랭이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도
되는 독특한 제차이다. 먼저 미지가 자신의 사설로 손님이나 군웅을 청한 다음에 화랭이와 맞
서서 수작을 하고, 화랭이가 장구나 꽹과리 장단에 공수답을 한다. 공수답이 끝나면 이어서 화
랭이 혼자서 부채를 들고 고수와 함께 <군웅노정기> 또는 <손님노정기>를 밤새워 한다.
다음으로 화랭이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굿거리는 뒷전이다. 뒷전은 화랭이 2인이 굿꾼과
깨낌꾼으로 나뉘어서 깨낌을 한 뒤에 이어서 굿꾼과 깨낌꾼의 연극적 놀이를 하는 굿거리이
다. 그런데 본디 굿의 기능은 잡귀잡신을 쫓는 것이지만, 그러한 축귀의례를 화랭이가 철저하
게 창과 노래를 진행시키는 점이 다른 여느 지역의 뒷전과는 차이가 있는 특징이다. 모든 액과
잡귀를 담고 있는 정애비를 불태움으로써 이 굿거리는 끝막음을 한다.
이용우는 <터벌림>, <손님노정기>, <군웅노정기>, <뒷전>을 직접 집전하던 빼어난 화랭이
였다. 터벌림에서 보여준 진쇠장단, 모리장단에 따른 터벌림춤은 그윽하고 단아한 멋이 있었
다. <군웅노정기>에서는 변화무쌍한 장단에 맞추어서 마달을 엮어나가는 솜씨가 눈에 선하다.
뒷전에서는 품위 있는 깨낌춤과 다양한 춤사위, 발림, 마달의 짜임새가 탁월했던 것으로 기억
된다. 46)
이상 화랭이 이용우의 삶은 오랜 공력에 의해서 스스로 터득한 미립(米粒)과 단단한 도당굿
판에서 익힌 경륜이 도당굿판의 한 세대를 풍미했었다.
무가 면에서는 부정청배, 조상청배, 고사덕담, 군웅노정기 시작부분의 공수답 등 네 가지
‘화랭이’무가사설의 내용은 지두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핵심적인 사설은 <천황씨>ㆍ<치
국잡기>ㆍ<도읍마련>ㆍ<일품>ㆍ<정성: 날잡기>ㆍ<임신청좌: 신명열거> 등이다.
나머지 제석청배나 시루청배 등은 이종만의 열두거리문서와 연관되어 있으며, 서사구조를
46) 이용우[李龍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9363&c
id=46661&categoryId=46661: 『경기굿』 (경기도국악당, 2008), 김헌선, 『한국 화랭이 무속의 역사와 원리』 (지식산업
사, 1997)
296 이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