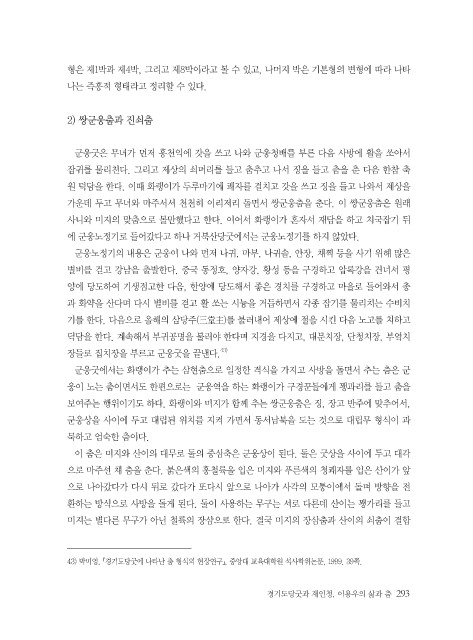Page 295 - 오산학 연구 1집
P. 295
형은 제1박과 제4박, 그리고 제8박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박은 기본형의 변형에 따라 나타
나는 즉흥적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쌍군웅춤과 진쇠춤
군웅굿은 무녀가 먼저 홍천익에 갓을 쓰고 나와 군웅청배를 부른 다음 사방에 활을 쏘아서
잡귀를 물리친다. 그리고 제상의 쇠머리를 들고 춤추고 나서 징을 들고 춤을 춘 다음 한참 축
원 덕담을 한다. 이때 화랭이가 두루마기에 쾌자를 걸치고 갓을 쓰고 징을 들고 나와서 제상을
가운데 두고 무녀와 마주서서 천천히 이리저리 돌면서 쌍군웅춤을 춘다. 이 쌍군웅춤은 원래
사니와 미지의 맞춤으로 볼만했다고 한다. 이어서 화랭이가 혼자서 재담을 하고 치국잡기 뒤
에 군웅노정기로 들어갔다고 하나 거북산당굿에서는 군웅노정기를 하지 않았다.
군웅노정기의 내용은 군웅이 나와 먼저 나귀, 마부, 나귀솔, 안장, 채찍 등을 사기 위해 많은
별비를 걷고 강남을 출발한다. 중국 동정호, 양자강, 황성 등을 구경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
양에 당도하여 기생점고한 다음, 한양에 당도해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마을로 들어와서 총
과 화약을 산다며 다시 별비를 걷고 활 쏘는 시늉을 거듭하면서 각종 잡기를 물리치는 수비치
기를 한다. 다음으로 올해의 삼당주(三堂主)를 불러내어 제상에 절을 시킨 다음 노고를 치하고
덕담을 한다. 계속해서 부귀공명을 불러야 한다며 지경을 다지고, 대문치장, 단청치장, 부엌치
장들로 집치장을 부르고 군웅굿을 끝낸다. 43)
군웅굿에서는 화랭이가 추는 삼현춤으로 일정한 격식을 가지고 사방을 돌면서 추는 춤은 군
웅이 노는 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웅역을 하는 화랭이가 구경꾼들에게 꽹과리를 들고 춤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화랭이와 미지가 함께 추는 쌍군웅춤은 징, 장고 반주에 맞추어서,
군웅상을 사이에 두고 대립된 위치를 지켜 가면서 동서남북을 도는 것으로 대립무 형식이 과
묵하고 엄숙한 춤이다.
이 춤은 미지와 산이의 대무로 둘의 중심축은 군웅상이 된다. 둘은 굿상을 사이에 두고 대각
으로 마주선 채 춤을 춘다. 붉은색의 홍철륙을 입은 미지와 푸른색의 청쾌자를 입은 산이가 앞
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사각의 모퉁이에서 돌며 방향을 전
환하는 방식으로 사방을 돌게 된다. 둘이 사용하는 무구는 서로 다른데 산이는 꽹가리를 들고
미지는 별다른 무구가 아닌 철륙의 장삼으로 한다. 결국 미지의 장삼춤과 산이의 쇠춤이 결합
43) 박미영, 『경기도당굿에 나타난 춤 형식의 현장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9쪽.
경기도당굿과 재인청, 이용우의 삶과 춤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