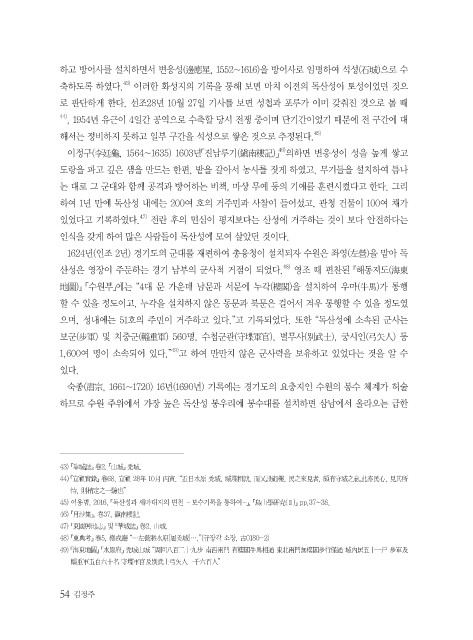Page 56 - 오산학 연구 5집
P. 56
하고 방어사를 설치하면서 변응성(邊應星, 1552~1616)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석성(石城)으로 수
43)
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화성지의 기록을 통해 보면 마치 이전의 독산성이 토성이었던 것으
로 판단하게 한다. 선조28년 10월 27일 기사를 보면 성첩과 포루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볼 때
44)
, 1954년 유근이 4일간 공역으로 수축할 당시 전쟁 중이며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
해서는 정비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을 석성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45)
46)
이정구(李廷龜, 1564~1635) 1603년「진남루기(鎭南樓記)」 의하면 변응성이 성을 높게 쌓고
도랑을 파고 깊은 샘을 만드는 한편,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게 하였고, 무기들을 설치하여 틈나
는 대로 그 군대와 함께 공격과 방어하는 비책, 마상 무예 등의 기예를 훈련시켰다고 한다. 그리
하여 1년 만에 독산성 내에는 200여 호의 거주민과 사찰이 들어섰고, 관청 건물이 100여 채가
47)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전란 후의 민심이 평지보다는 산성에 거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독산성에 모여 살았던 것이다.
1624년(인조 2년) 경기도의 군대를 재편하여 총융청이 설치되자 수원은 좌영(左營)을 맡아 독
48)
산성은 영장이 주둔하는 경기 남부의 군사적 거점이 되었다. 영조 때 편찬된 『해동지도(海東
地圖)』 「수원부」에는 “4대 문 가운데 남문과 서문에 누각(樓閣)을 설치하여 우마(牛馬)가 통행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누각을 설치하지 않은 동문과 북문은 걸어서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였
으며, 성내에는 51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독산성에 소속된 군사는
보군(步軍) 및 치중군(輜重軍) 560명, 수첩군관(守堞軍官), 별무사(別武士), 궁시인(弓矢人) 등
49)
1,6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 고 하여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종(肅宗, 1661~1720) 16년(1690년) 기록에는 경기도의 요충지인 수원의 봉수 체계가 허술
하므로 수원 주위에서 가장 높은 독산성 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하면 삼남에서 올라오는 급한
43) 『華城誌』 卷2. 「山城」 禿城.
44) 『宣祖實錄』 卷68, 宣祖 28年 10月 丙寅. “近日水原 禿城, 城堞粗就, 而又設砲樓, 民之來見者, 頗有守城之意。此亦民心, 見其所
恃, 則稍定之一驗也”
45) 이용범, 2016,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변천 –보수기록을 통하여-」, 『烏山學硏究(Ⅱ)』 pp.37~38.
46) 『月沙集』, 卷37, 鎭南樓記.
47) 『東國輿地志』 및 『華城誌』 卷2, 山城.
48) 『東典考』 卷5, 樬戎廳 “…左營將水原[屬禿城]….”(규장각 소장, 古0180-2)
49) 『海東地圖』 「水原府」 禿城山城 “周回八百二十九步 南西兩門 有樓閣牛馬相通 東北兩門無樓閣步行僅通 城內居五十一戶 步軍及
輜重軍五白六十名 守堞軍官及別武士弓矢人一千六百人”
54 김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