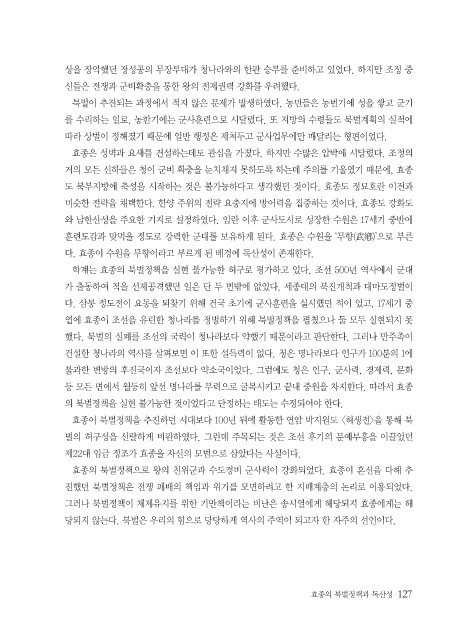Page 129 - 오산문화총서 8집
P. 129
상을 장악했던 정성공의 무장부대가 청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정 중
신들은 전쟁과 군비확충을 통한 왕의 전제권력 강화를 우려했다.
북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성을 쌓고 군기
를 수리하는 일로,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으로 시달렸다. 또 지방의 수령들도 북벌계획의 실적에
따라 상벌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반 행정은 제쳐두고 군사업무에만 매달리는 형편이었다.
효종은 성벽과 요새를 건설하는데도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수많은 압박에 시달렸다. 조정의
거의 모든 신하들은 청이 군비 확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효종
도 북부지방에 축성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효종도 정묘호란 이전과
비슷한 전략을 채택한다. 한양 주위의 전략 요충지에 방어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효종도 강화도
와 남한산성을 주요한 기지로 설정하였다. 임란 이후 군사도시로 성장한 수원은 17세기 중반에
훈련도감과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 효종은 수원을 ‘무향(武鄕)’으로 부른
다. 효종이 수원을 무향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에 독산성이 존재한다.
학계는 효종의 북벌정책을 실현 불가능한 허구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군대
가 출동하여 적을 선제공격했던 일은 단 두 번밖에 없었다. 세종대의 북진개척과 대마도정벌이
다. 삼봉 정도전이 요동을 되찾기 위해 건국 초기에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적이 있고, 17세기 중
엽에 효종이 조선을 유린한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북벌정책을 펼쳤으나 둘 모두 실현되지 못
했다. 북벌의 실패를 조선의 국력이 청나라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주족이
건설한 청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청은 명나라보다 인구가 100분의 1에
불과한 변방의 후진국이자 조선보다 약소국이었다. 그럼에도 청은 인구, 군사력, 경제력,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선 명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끝내 중원을 차지한다. 따라서 효종
의 북벌정책을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효종이 북벌정책을 추진하던 시대보다 100년 뒤에 활동한 연암 박지원도 <허생전>을 통해 북
벌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제22대 임금 정조가 효종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효종의 북벌정책으로 왕의 친위군과 수도경비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효종이 혼신을 다해 추
진했던 북벌정책은 전쟁 패배의 책임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지배계층의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북벌정책이 체제유지를 위한 기만책이라는 비난은 송시열에게 해당되지 효종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다. 북벌은 우리의 힘으로 당당하게 역사의 주역이 되고자 한 자주의 선언이다.
효종의 북벌정책과 독산성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