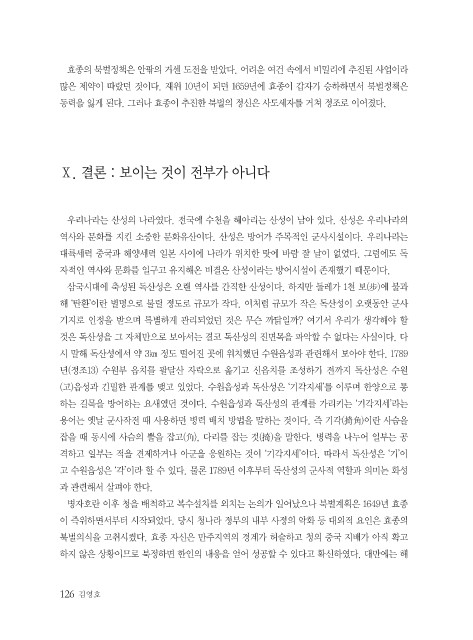Page 128 - 오산문화총서 8집
P. 128
효종의 북벌정책은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밀리에 추진된 사업이라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재위 10년이 되던 1659년에 효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북벌정책은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효종이 추진한 북벌의 정신은 사도세자를 거쳐 정조로 이어졌다.
Ⅹ. 결론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였다. 전국에 수천을 헤아리는 산성이 남아 있다. 산성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킨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산성은 방어가 주목적인 군사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 중국과 해양세력 일본 사이에 나라가 위치한 탓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독
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일구고 유지해온 비결은 산성이라는 방어시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축성된 독산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산성이다. 하지만 둘레가 1천 보(步)에 불과
해 ‘탄환’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작다. 이처럼 규모가 작은 독산성이 오랫동안 군사
기지로 인정을 받으며 특별하게 관리되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독산성을 그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결코 독산성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
시 말해 독산성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수원읍성과 관련해서 보아야 한다. 1789
년(정조13)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자락으로 옮기고 신읍치를 조성하기 전까지 독산성은 수원
(고)읍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원읍성과 독산성은 ‘기각지세’를 이루며 한양으로 통
하는 길목을 방어하는 요새였던 것이다. 수원읍성과 독산성의 관계를 가리키는 ‘기각지세’라는
용어는 옛날 군사작전 때 사용하던 병력 배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기각(掎角)이란 사슴을
잡을 때 동시에 사슴의 뿔을 잡고(角), 다리를 잡는 것(掎)을 말한다. 병력을 나누어 일부는 공
격하고 일부는 적을 견제하거나 아군을 응원하는 것이 ‘기각지세’이다. 따라서 독산성은 ‘기’이
고 수원읍성은 ‘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789년 이후부터 독산성의 군사적 역할과 의미는 화성
과 관련해서 살펴야 한다.
병자호란 이후 청을 배척하고 복수설치를 외치는 논의가 일어났으나 북벌계획은 1649년 효종
이 즉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청나라 정부의 내부 사정의 악화 등 대외적 요인은 효종의
북벌의식을 고취시켰다. 효종 자신은 만주지역의 경계가 허술하고 청의 중국 지배가 아직 확고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북정하면 한인의 내응을 얻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대만에는 해
126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