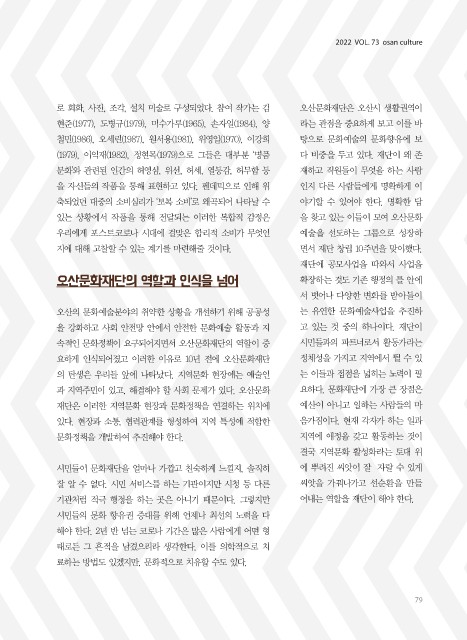Page 81 - 오산문화 73호
P. 81
2022 VOL. 73 osan culture
로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술로 구성되었다. 참여 작가는 김 오산문화재단은 오산시 생활권역이
현준(1977), 도병규(1979), 미수가루(1965), 손자일(1984), 양 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를 바
철민(1986), 오세린(1987), 원서용(1981), 위영일(1970), 이강희 탕으로 문화예술의 문화향유에 보
(1979), 이익재(1982), 정현목(1979)으로 그들은 대부분 ‘명품 다 비중을 두고 있다. 재단이 왜 존
문화’와 관련된 인간의 허영심, 위선, 허세, 열등감, 허무함 등 재하고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
을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펜데믹으로 인해 위 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
축되었던 대중의 소비심리가 ‘보복 소비’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답
있는 상황에서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복합적 감정은 을 찾고 있는 이들이 모여 오산문화
우리에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 예술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성장하
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면서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재단에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오산문화재단의 역할과 인식을 넘어 확장하는 것도 기존 행정의 틀 안에
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
오산의 문화예술분야의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 는 유연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
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과 지 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재단이
속적인 문화정책이 요구되어지면서 오산문화재단의 역할이 중 시민들과의 파트너로서 활동가라는
요하게 인식되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10년 전에 오산문화재단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뛸 수 있
의 탄생은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지역문화 현장에는 예술인 는 이들과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필
과 지역주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있다. 오산문화 요하다. 문화재단에 가장 큰 장점은
재단은 이러한 지역문화 현장과 문화정책을 연결하는 위치에 예산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
있다. 현장과 소통,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음가짐이다. 현재 각자가 하는 일과
문화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결국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토대 위
시민들이 문화재단을 얼마나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지, 솔직히 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잘 알 수 없다. 시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만 시청 등 다른 씨앗을 가꿔나가고 선순환을 만들
기관처럼 적극 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내는 역할을 재단이 해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2년 반 넘는 코로나 기간은 많은 사람에게 어떤 형
태로든 그 흔적을 남겼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의학적으로 치
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