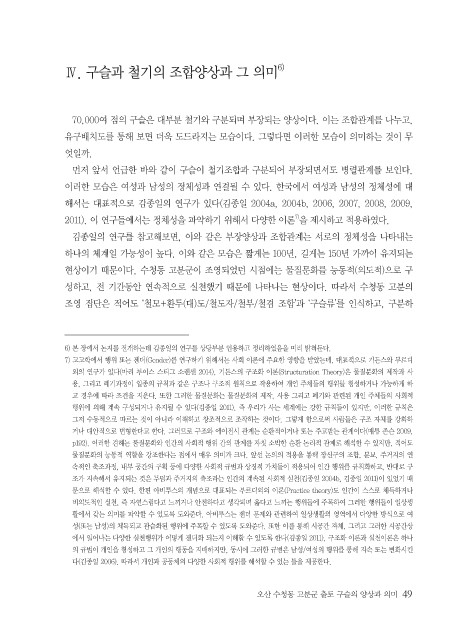Page 51 - 오산학 연구 6집
P. 51
Ⅳ. 구슬과 철기의 조합양상과 그 의미 6)
70,000여 점의 구슬은 대부분 철기와 구분되며 부장되는 양상이다. 이는 조합관계를 나누고,
유구배치도를 통해 보면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
엇일까.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슬이 철기조합과 구분되어 부장되면서도 병렬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에 대
해서는 대표적으로 김종일의 연구가 있다(김종일 2004a, 2004b, 2006, 2007, 2008, 2009,
7)
2011). 이 연구들에서는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 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김종일의 연구를 참고해보면, 이와 같은 부장양상과 조합관계는 서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150년 가까이 유지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수청동 고분군이 조영되었던 시점에는 물질문화를 능동적(의도적)으로 구
성하고, 전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수청동 고분의
조영 집단은 적어도 ‘철모+환두(대)도/철도자/철부/철겸 조합’과 ‘구슬류’를 인식하고, 구분하
6) 본 장에서 논지를 전개하는데 김종일의 연구를 상당부분 인용하고 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7) 고고학에서 행위 또는 젠더(Gender)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론에 주요한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기든스와 부르디
외의 연구가 있다(마리 루이스 스티그 소렌센 2014).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은 물질문화의 제작과 사
용, 그리고 폐기과정이 일종의 규칙과 같은 구조나 구조적 원칙으로 작용하여 개인 주체들의 행위를 형성하거나 가능하게 하
고 경우에 따라 조건을 지운다. 또한 그러한 물질문화는 물질문화의 제작, 사용 그리고 폐기와 관련된 개인 주체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계속 구성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김종일 2011). 즉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강한 규칙들이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구조 자체를 강화하
거나 대안적으로 변형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구조와 에이전시 관계는 순환적이거나 또는 주고받는 관계이다(매튜 존슨 2009,
p192). 이러한 견해는 물질문화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 간의 관계를 자칫 소박한 순환 논리적 관계로 해석한 수 있지만, 적어도
물질문화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앞선 논의의 적용을 통해 장신구의 조합, 분묘, 주거지의 연
속적인 축조과정, 내부 공간의 구획 등에 다양한 사회적 규범과 상징적 가치들이 적용되어 인간 행위를 규칙화하고, 반대로 구
조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무덤과 주거지의 축조라는 인간의 계속된 사회적 실천(김종일 2004b, 김종일 2011)이 있었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비투스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부르디외의 이론(Practice theory)도 인간이 스스로 체득하거나
비의도적인 실천, 즉 자연스럽다고 느끼거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며 옳다고 느끼는 행위들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들이 일상생
활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비투스는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
성(또는 남성)의 체득되고 관습화된 행위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를 통해 시공간 자체, 그리고 그러한 시공간상
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천행위가 어떻게 젠더화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김종일 2011). 구조화 이론과 실천이론은 하나
의 규범이 개인을 형성하고 그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규범은 남성/여성의 행위를 통해 지속 또는 변화시킨
다(김종일 2006).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오산 수청동 고분군 출토 구슬의 양상과 의미 49